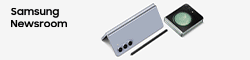대학졸업 후 기자생활 20년, 그동안 내 연봉이 많다고 여겨본 적은 별로 없다. 그런데 결코 적지 않구나 생각하게 된 계기가 최근 있었다. 지난주에 정부가 세법개정안과 후속 설명자료 등을 내놨는데 이런 표현이 있다.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이게 결국 '월급쟁이 세금폭탄'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바로 이 문장이다. '근로소득 상위 28%에 해당하는 3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은 다소 증가하지만…" 28%는 3분의 1(33.3%)보다는 4분의 1(25%)쪽에 더 가깝다. 3450만원은 그만큼 높은 소득이라는 얘기다. 내 연봉은 이보다 2배 이상 많다.
◇ '월 1만원이 무슨 세금폭탄이냐'
정부는 세금폭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자 3450만원 미만 근로자 72%는 세금이 감소하는데 왜 세금폭탄이냐고 항변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중산층의 추가 세부담이 한달 평균 1만원 정도라면서 '십시일반으로 조금 기여한다고 생각해야지'라고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감내를 해줘야지 않겠느냐'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한달에 1만원 세금 더 내는 게 뭐 그리 대수랴. '커피 몇 잔 아껴서' 취약계층 부담 좀 덜어주자는 건데.
그런데 왜 난리들일까? 우선 3450만원이 과연 어떤 소득 수준인지 한 번 따져보자.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3450만원은 올해 대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3352만원)보다 100만원 더 많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졸 초임 연봉은 대략 2500~3000만원 정도로 본다. 3450만원은 일반 기업의 대리급 연봉쯤 될 것이다. 나이는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이 대부분일 게다.
소득이 이보다 낮은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도 있겠지만 이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중 40% 가까이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 '3450만원 중산층'..그들은 누구인가
문제의 출발점은 여기다. 대한민국 일반 기업에 다니는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납세자들이 소득상위 28%에 속하고, 이 소득계층부터 세부담을 늘려 더 아래계층의 복지를 책임지게 한다는 것 말이다. 비록 1만원짜리 한 장에 불과할 지라도 여기서부터 세금을 매기는 자와 세금을 내야 하는 자간에 심각한 인식의 괴리가 발생한다.
소득 상위권 28%에 소속되기 시작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대학을 나온 청춘들은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을 넘어 '3포 세대'로 불려왔다. 취업난이 심각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다. 그러다 겨우 일자리를 잡아도 앞으로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대기업 직원의 경우 월급의 절반을 꾸준히 저축해도 서울 시내에 웬만한 아파트 전세를 얻는데 10년 정도 걸린다.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집 마련은 꿈꾸기 어렵다. 그래서 빚을 얻고 매달 원리금 상환에 허덕인다.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월세를 줄 형편이 못되면 서울 시내에서 주변부로, 다시 외곽으로 전셋집을 떠돌아야 한다.
맞벌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니 출산과 육아가 고민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게 빈약한 보육 시스템 아니던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정규직 일자리가 흔하기나 한가. 비정규직 연봉으론 베이비시터 월급 감당하기도 빠듯하다. '3자녀 = 부(富)의 상징'이란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 가진 자들로부터 더 걷고, 그동안 봐주던 세금을 줄인다는 것이다. 총론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도 얼렁뚱땅 넘기려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 오락가락 하는 정부·여당..1만원의 문제 아냐
우선 3450만원부터 세금을 더 매기게 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정부·여당이 맞추고 자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기준도 왔다갔다 한다. 세금 부과 기준으로 보면 3450만원부터를 중산층으로 인식한 셈인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총소득 4000만원이다. 세금을 매길 때는 중산층, 정부 지원시에는 수혜층이 되는 것이다. 4000만원 미만 소득자에게 장려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었다면 세부담을 늘리는 출발선도 그 이상으로 잡는 게 합당하다.
정부의 해명도 불신을 더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중 72%는 혜택을 본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고 했지만 72%중 상당수는 원래부터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자녀장려금 등으로 지원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금은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많다.
월급쟁이들을 화나게 한 것은 1만원이란 돈이 아니다. 비판을 불러온 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콘텍스트(context)다. 문장 자체보다는 흐름과 맥락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다. 행간을 읽지 못하고 책상물림들이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세금폭탄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1%대 99%의 투쟁은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며 증폭됐다.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재벌의 탐욕이 도마에 올랐고 총수 일가들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비난이 쇄도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고, 증세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땅의 월급쟁이들은 아마도 새 정부가 가진 1%와 재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늘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집을 보면 이런 가정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 첫 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월급쟁이들의 기대와는 딴판이었다. 3450만원? '결국 내가 더 내야 하고, 만만한 유리지갑만 털리는구나'로 귀결됐다.
세금 논란의 배경엔 뒤통수를 맞은 월급쟁이들의 배신감이 자리잡고 있다. 저 쪽에 쏘아야 할 화살을 왜 힘없는 우리한테 겨누느냐는 거다. 이럴 거였으면 국민을 상대로 사탕발림 공약을 내놓질 말던가. 이런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달에 1만원' '커피 몇 잔 아끼면…' 운운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 이들의 세비와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니 더욱 분통터질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