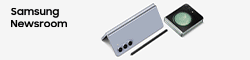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한 소형 은행의 신탁 담당자들이 걸렸다. “금융법률과 규정에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무엇이 잘못이냐”며 항변했다. 그러나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보직 해임 명령도 받았다. 은행은 담당자들을 신탁업무에서 뺐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직원들은 해외로 나갔다. 은행은 그들에게 특별 해외연수를 줬다. 은행은 말했다. “당국의 지시는 따랐다. 그리고 은행과 고객에게 큰 이익을 안겨준 직원들에겐 보상이 필요하다”고.

규제 당국과 민간업계는 이렇게 매일 숨바꼭질을 한다. 금융부문은 더 심하다. 금융시장을 다루는 특성상 모든 사항을 법률과 규정으로만 할 순 없다. 돌발적인 시장의 혼란에 대응하는 정책 당국의 방식은 솔직히 구두지시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함정이다. 이것만큼 달콤한 것이 없다. 그렇게 금융감독당국은 편한 길을 택한다. 근거는 없고 증거도 남지 않는 서로의 봐주기는 그렇게 금융시장에 뿌리를 깊게 내렸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는 어제(15일), 이처럼 편한 방식인 비공식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금융회사의 가격·수수료, 배당 같은 경영판단 사항에 당국이 법적 근거가 없이 개입하는 것도 통제하겠다고 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금감원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인이 이 말을 믿지 않는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왜?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이런 발표는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이 바뀔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그때마다 그럴듯한 선언이 뒤따랐다. 공무원이 스스로 제 머리를 깎지 못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업계를 참여시켜 그럴듯한 모양을 갖췄던 것도 똑같다.
어제 금융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권에서 만들어진 모범규준이 5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말을 빌리면 모범규준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다. 그러나 모범규준을 만들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 당시 이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금감원의 임원이고, 금융위의 고위 공무원들이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림자 규제로 전락하는 순간,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실무자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 그림자 규제’ 탓에 현장에선 여전히 힘들다는 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오래된 관행 ‘관치’가 실무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순간이다. 실무자들의 독단적인 행동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이 뿌리 깊은 그림자 규제가 일개 조사역과 사무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주요 언론들은 이 금융위의 선언을 중요 기사로 다뤘다. 매번 그랬듯이. 그러나 이 역시 허언(虛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인은 “지면 낭비도 이런 지면 낭비가 없다”고 꼬집는다. 임종룡 위원장과 금융위의 선언을 폄훼할 의도는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금융인들의 시선이 대부분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양치기 소년’이 된 금융위를 보는 것이 안타깝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임종룡 위원장이 또 다른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