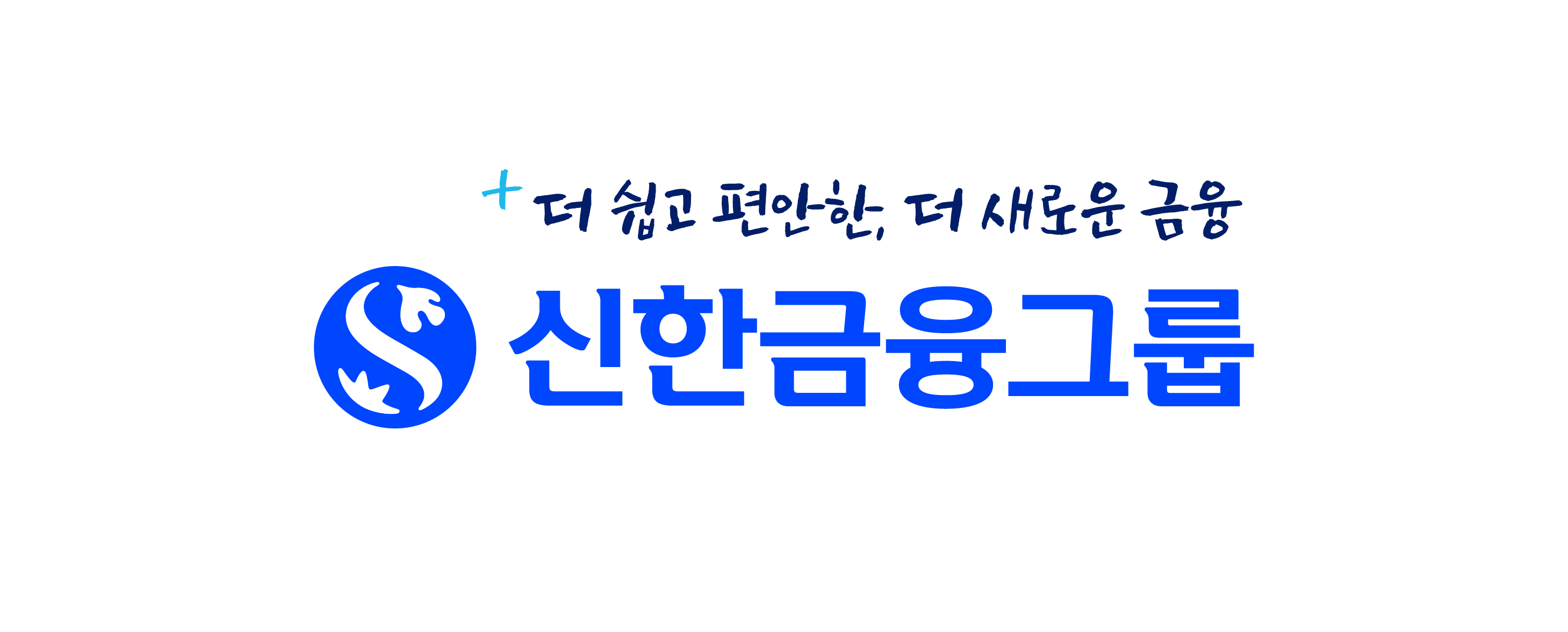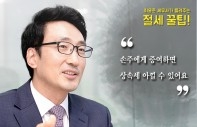전월세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죠. 대출금 비중이 너무 높으면 경우에 따라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출 외에도 집주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낙찰금에서 세금부터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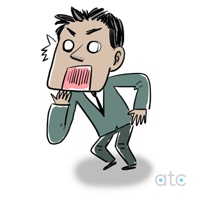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줄 것 같지만 일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3400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죠. 지방의 경우 최우선변제 금액은 더 적고요.
그 외에는 나라살림이 개인의 살림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뒀더라도 세금 앞에서는 소용이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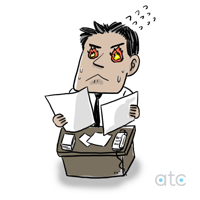
설마 '세금 몇푼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하고 지나치기에는 돌발적인 세금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그 액수가 적지만 사업을 하는 집주인의 경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수도 있고요. 전셋집이 마침 집주인의 상속재산인데 현금이 없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은 등기부등본에 은행의 채권(근저당권)으로 적혀 있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세무서의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조세채권으로 표시(촉탁등기)가 돼 있지만 아직 압류까지 진행되지 않은 체납세금은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또 촉탁등기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납세정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행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요. 미납세금열람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에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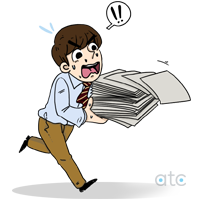
그런데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열람신청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청서에 집주인의 서명도 넣어야 하고요. 집주인 신분증 사본도 가져가야 하죠.
절대 '을'(乙)인 세입자가 그것도 임대계약서도 쓰기 전에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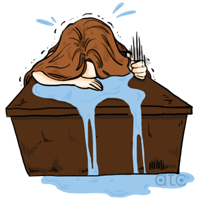
운 좋게 쿨한 집주인을 만나 체납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100%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고 매년 혹은 수시로 발생하니까요. 미납세금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언제 어떤 세금을 체납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엔 등기부등본에 세금체납 사실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등기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납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과의 충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안타깝지만 집주인의 세금체납 리스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판매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있는데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연간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28%,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53%로 차이가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각각 연간 38만4000원과 45만9000원으로 HUG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죠. 다만 HUG 상품은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가입제한이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료도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대안으로 고민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