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를 별도로 구분해 규제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내 최대 검색포털 네이버가 '업계 자율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전날(3일)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주최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 토론회에 참석해 "업계 스스로 규제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부처가) 인정하고 자율규제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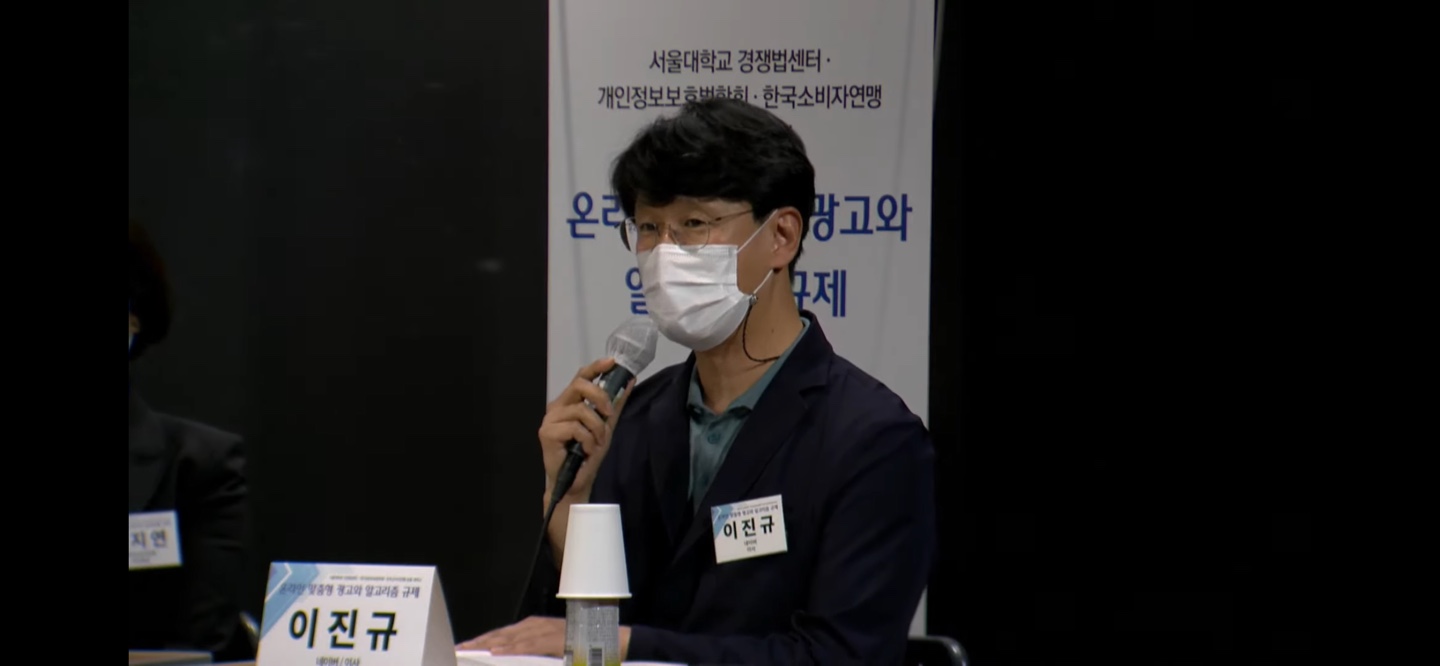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된 부분은 맞춤형 광고를 별도로 표시하게 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고지하고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이며 플랫폼의 발전에 장애가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 가운데 유일한 업체 관계자인 이진규 CPO는 구글과 애플 등의 사례를 들며 플랫폼 업체들의 자성 노력을 강조했다.
현재 구글은 자사 웹 브라우저인 크롬의 제3자 쿠키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애플도 iOS 14.5에 앱추적 금지 기능을 탑재했다.
이 CPO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 이전에 규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광고가 무엇인지, 과거와 현대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규제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지 명확히 따져본 뒤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는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효용이 낮아지더라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업 하지 말자'고 하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s)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이트에서 불편함을 겪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들 사이트는 광고 서비스를 불편하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 전반적인 웹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