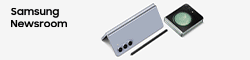지난해 대기업 상장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투자를 단행해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주주에게 환원하는 순환구조가 이상적이지만, 대기업 상장사들은 증자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다만 회사채,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은 늘었다. 증자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기 보단 채권자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선호한 것이다. 밸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 제고) 등 주주가치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에서 자칫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뒤따를 수 있는 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4년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의 공모발행(50인 이상) 실적은 172건이다. 공모발행을 통해 상장사들이 확보한 자금규모는 8조8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발행 건수와 자금규모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3년 공모발행 건수는 184건, 자금규모는 10조8569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12건, 자금규모는 2조364억원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지난해 주식발행실적이 더욱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시기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규모는 △2020년 10조9164억원 △2021년 29조903억원 △2022년 21조940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주식발행을 통해 상장사들이 확보한 자금규모는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식발행 가운데 IPO는 지난해 116건, 4조1171억원으로 2023년(113건, 3조5997억원)보다 늘었다. 하지만 유상증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이루어진 유상증자는 56건이며, 상장사들이 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4조7034억원이다. 이는 2023년(65건, 7조2572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1000억원 이상의 IPO가 2023년 대비 다소 늘었고 IPO 1건 당 평균 공모금액도 증가했다"며 "반면 시설투자 등 대기업의 증자 규모는 크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주식발행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 상장사들의 유상증자가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투자행위 자체가 줄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이미 확보했어야 할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자금이 부족해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중소기업 유상증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사의 유상증자 건수는 8건, 자금조달규모는 2조617억원을 기록했다. 자금조달규모는 2023년(5조2659억원)보다 60.8% 급감했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42건, 2조2616억원을 기록했는데 자금조달규모가 2023년(1조6928억원)보다 33.6% 증가했다.
대기업 상장사들은 증자보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택했다. 지난해 회사채 발행실적은 총 4554건으로 확보한 자금규모는 278조243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4288건, 234조8113억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회사채 잔액도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692조7242억원으로 2023년 말(641조3262억원) 대비 51조3980억원이 증가했다. 잔액이 늘었다는 건 신규 발행과 함께 기존 발행물량을 상환하지 않고 차환하는 수요도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어음(CP) 발행과 단기사채 발행 규모 역시 늘었다. 지난해 CP발행액은 435조195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조790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단기사채 발행액은 868조3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8306억원 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상장사들은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유상증자를 택하기 보단 회사채, CP 등 주주를 거치지 않는 방식의 자금조달을 선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