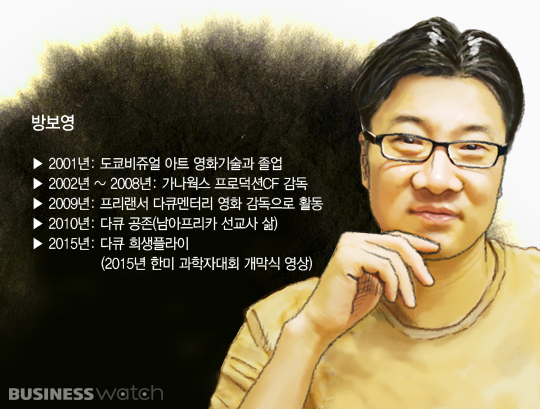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같은 대학 노어노문학과 박사.
박사가 연극을 한다.
배고픈 연극판에서 신영선 연출가는 배가 고파도 좋단다.

그녀는 꽤나 촉망받는 희곡작가였다.
26살이던 2004년 옥랑희곡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그녀는 또 한번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다.
아픈 청춘들을 위해 연출자로 첫 발을 내딛었다.

연극팀원들은 오디션은 물론 별다른 학연도 지연도 없이
그때그때 인연이 닿는대로 뽑았다.
모일 때가 되니 모였고, 시작할 때가 되니 시작했다.

팀원 중 윤소연 씨도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다시 서울예대 연기과에 입학해 연기 수업을 받았다.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연극인의 길을 고집했다.
"내가 연기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고생해도 좋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으니까"

'팀 스케네(TeamSkene)'라는 이름으로 최근 창단공연을 마쳤다.
연극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지는 않다.
연극은 내가 생각하는 형식이다.
연극을 통해 읽고 쓰고 또 말한다.
제작자로서 또 연출자로서 항상 돈이 부족하고 아쉽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땐 아슬아슬하게 채워지곤 한다.
생각지 못한 후원과 격려가 많다.
'볼만한 공연 좀 만들어 주세요'라는 후원자의 한 마디는
가장 큰 빚이면서 가장 큰 격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