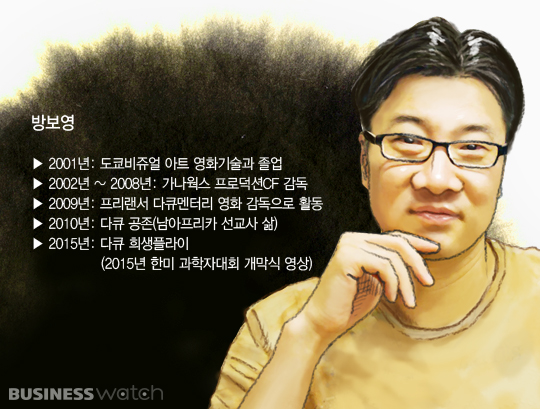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회색빛이 더 잘 어울릴 듯한 동네다.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기름때가 여기저기 건물마다 묻어난다.

이런 곳에 현대작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문래동 창작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건 2010년 무렵부터다. 신미정 작가의 작업실 역시 여기에 있다. 신 작가는 프랑스 디종 보자르 미술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후 퍼포먼스와 설치, 영상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실험작품에 도전하고 있다.

신 작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2013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순수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긴 쉽지 않았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문래동에서 재건축을 앞두고 방치된 빈 공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듯한 폐건물에서 ‘SELF DEFENSE’라는 타이틀로 첫 귀국전시회를 열었다. 지붕이 무너져 빛이 새 들어오는 바람에 전시는 밤 시간대만 가능했다. 먼지가 많아 관람객들은 모두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다.

탤런트 권오중 씨가 전시회를 찾았다. 홍익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그는 신 작가의 팬이다. 권 씨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신 작가의 작품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암사슴 같은 느낌이다. 30대 초반의 나이도 작품에선 가늠하기 어렵다. 전시했던 공장에 도둑이 들어 작품과 재료를 도난당한 적이 있다. 신 작가는 마치 도둑이 보란 듯 <폐공장 도난사건>이란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어 유니크함을 보여줬다. 얼마 전엔 <식민지 / 추억>이란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 이리(지금의 익산)에 사시던 일본 할머니의 추억을 영상으로 내놓기도 했다. 신 작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주제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배출하는 작가다.”

지금도 문래동은 여전히 기계음과 시커먼 먼지로 뒤덮여 있다. 신 작가가 그 공간에 머물면서 찾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그는 문래동이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공장엔 아직도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남기고 간 물품과 서류, 사진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 소외되고, 잊혀진 공간에 봄처럼 따뜻한 관심을 불어넣는 역할이 바로 신 작가의 몫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