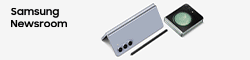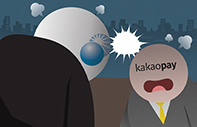<글 싣는 순서>
1부 : 새로운 화폐 질서를 꿈꾸다①공상 과학 영화처럼 등장한 비트코인
②탐욕스런 금융의 본질을 찾아…
③{근대 금융의 위기=신용•신뢰의 위기}?
④화폐의 새 질서를 요구한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 그의 논문 제목이다. 이런저런 디지털 전자화폐의 개념과 활용사례는 1990년대부터 이미 넘쳐났다. 비트코인도 처음엔 기술 개발자들만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디지털 화폐와는 달리 경제사(經濟史)적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포인트는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오큐파이(Occupy, Wall Street) 운동이다. 2007년쯤부터 이상 징후를 보인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세 도미노가 일어났다. 유럽에선 정부 재정 문제로 번졌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직격탄을 날렸다.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들이 내 일자리를 빼앗자 대중들은 분노했다. “꼬박꼬박 세금 다 냈는데, 왜? 도대체 왜?” 이들의 분노는 간명했다.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과 함께 1년여를 유럽 대륙에 머문 태풍은 다시 대륙을 넘는다. 아랍의 봄을 거쳐 다시 월가로….
분노는 서서히 본질을 찾아간다. 전 세계를 한 바퀴 돈 분노의 열기는 시발점이었던 뉴욕 한복판에서 반(反) 월가를 외쳤다. 거대한 쓰나미처럼 전 세계의 분노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슬로건 밑으로 집결했다. 반(反) 월가 운동은 지금의 위기와 경제 모순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에서 출발한다고 봤다. 그래서 이 금융시스템을 99%의 대중에게 돌려놓을 것을 주장했다.
나카모토도 그의 논문에서 기존 화폐와 금융시스템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중앙은행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 화폐의 역사는 이런 믿음과는 다른 사례로 가득하고, 은행 또한 신뢰를 저버리고 신용 버블이라는 흐름 속에서 대출했다.” -나카모토의 10월 논문 中-
◇ 근대 화폐 40년 만에 맞은 위기
이런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류 경제학이 아니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자본의 엄청난 집중도가 1대 99를 만들고 결국 모순이 폭발한 것이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이어진 오큐파이 운동인지도 모른다. 주류 경제학에선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회복력이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있다고 자신한다.
어쨌든 ‘탐욕스런 금융’이라는 화두는 현재의 자본주의 금융•경제시스템을 정면에서 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을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관심을 끌었다. 반작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을 가진 이슈가 ‘새로운 화폐 논쟁’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책을 낸 김진화 코빗(Korbit•한국비트코인거래소) 이사는 책의 프롤로그를 프랑스에서 활동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John Law)라는 사람에서 시작한다. 그는 1716년 방크 제네럴이라는 이름의 근대적 은행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금본위제에서 돈(화폐)은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를 저장한다. 금과 화폐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다.
존 로는 이렇게 묶인 금과 화폐를 떼어놓는 발상으로 당시 프랑스의 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수완을 발휘한다. 부채의 경제학이다. 금본위제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폐기된 것은 1971년. 존이 태어난 지 300년이 된 해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하면서 금본위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때부터 종이 돈(화폐)은 근대적 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도적인 거래 수단’이라는 지위를 획득했다. 그리고 37년 만에 근대의 은행 시스템은 위기를 맞는다. 글로벌 금융 위기다. 여전히 이 위기는 진행형이다.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
현 시스템의 자연 복원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위기는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19일 미국은 드디어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했다. ‘푸는 돈의 규모를 서서히 줄인다’는 의미에서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부른다.
이견은 있다. 본지가 지난해 10월 8일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를 초청해 연 2014년 글로벌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그는 “정부 개입이 만든 자산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실물 금을 소유할 것을 조언한다”며 “(이런 자산 거품을 아는)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무한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 FOMC가 테이퍼링을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저금리를 약속하는 상황인 점을 보면, 파버와 같은 주장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류 경제학이 아니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자본의 엄청난 집중도가 1대 99를 만들고 결국 모순이 폭발한 것이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이어진 오큐파이 운동인지도 모른다. 주류 경제학에선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회복력이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있다고 자신한다.
어쨌든 ‘탐욕스런 금융’이라는 화두는 현재의 자본주의 금융•경제시스템을 정면에서 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을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관심을 끌었다. 반작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을 가진 이슈가 ‘새로운 화폐 논쟁’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책을 낸 김진화 코빗(Korbit•한국비트코인거래소) 이사는 책의 프롤로그를 프랑스에서 활동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John Law)라는 사람에서 시작한다. 그는 1716년 방크 제네럴이라는 이름의 근대적 은행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금본위제에서 돈(화폐)은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를 저장한다. 금과 화폐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다.
존 로는 이렇게 묶인 금과 화폐를 떼어놓는 발상으로 당시 프랑스의 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수완을 발휘한다. 부채의 경제학이다. 금본위제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폐기된 것은 1971년. 존이 태어난 지 300년이 된 해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하면서 금본위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때부터 종이 돈(화폐)은 근대적 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도적인 거래 수단’이라는 지위를 획득했다. 그리고 37년 만에 근대의 은행 시스템은 위기를 맞는다. 글로벌 금융 위기다. 여전히 이 위기는 진행형이다.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
현 시스템의 자연 복원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위기는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19일 미국은 드디어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했다. ‘푸는 돈의 규모를 서서히 줄인다’는 의미에서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부른다.
이견은 있다. 본지가 지난해 10월 8일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를 초청해 연 2014년 글로벌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그는 “정부 개입이 만든 자산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실물 금을 소유할 것을 조언한다”며 “(이런 자산 거품을 아는)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무한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 FOMC가 테이퍼링을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저금리를 약속하는 상황인 점을 보면, 파버와 같은 주장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