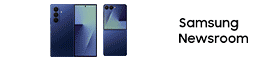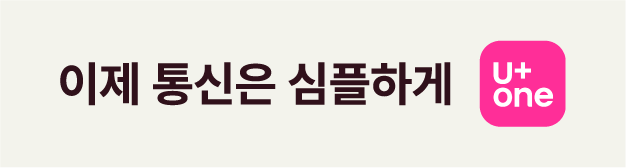올해 우리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알뜰폰 사업을 준비한 지 1년 만에 얻는 결실이다. 지난달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서류를 제출했다. 심사까지는 2~3개월 소요된다. 내부엔 모바일사업플랫폼부서를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인가가 나는 대로 '우리WON모바일' 사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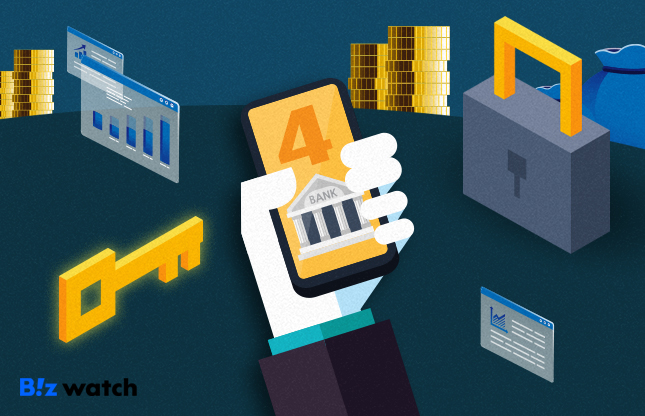
시중은행들이 비금융 상생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선두주자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다. 각각 알뜰폰과 배달앱을 신사업으로 택했다. 재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득보다 실이 크다. 당장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두 은행 모두 신사업 의지를 키워가고 있다. 신규 고객 유입과 데이터 확보라는 장기적 이점 때문이다. 이는 신사업에 소극적이던 다른 은행들을 자극했다. 우리은행도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이 신규 고객 유입이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KB리브모바일' 사업을 시작한 건 2019년이다.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주목받았다. 초기에는 중소사업자 밥그릇을 뺏는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현재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서비스 좋은 가성비 알뜰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KB국민은행의 목표였다.
실적 자체는 낙제점이다. 2019년 8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원대 손실을 냈다. 가입자 수는 40만명대에 그친다. 점유율은 5% 안팎이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 KB리브모바일 가입자 절반이 2030세대다. KB국민은행으로서는 잠재적 고객을 확보한 셈이다. 알뜰폰 연계 금융상품 마케팅을 넓혀가는 기반도 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로 고객들의 소비 형태를 파악한다. 앱에 등록된 요식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주문 내역과 앱 내 매출 등도 수집한다. 해당 데이터들은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영업 전략을 수립할 때 다양하게 활용된다. 실제 신한은행은 땡겨요에서 얻은 데이터로 '라이더대출', '땡겨요 사업자 대출' 등을 출시했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현재 서울, 경기, 충북, 전남, 광주, 대전, 인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충남과도 손잡았다.
해외에서는 은행이 비금융 신사업으로 신규 고객을 포섭하는 게 활발하다. 일본에서는 기업과 고령층을 타깃으로 잡았다. 기업의 탈탄소 경영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친환경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도 도입해 고령층 고객도 넓혀가고 있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IT기업을 인수해 신사업 사세를 넓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