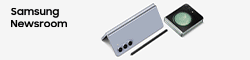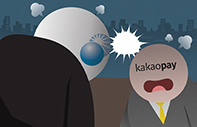<글 싣는 순서>
1부: 새로운 화폐 질서를 꿈꾸다①공상 과학 영화처럼 등장한 비트코인
②탐욕스런 금융의 본질을 찾아…
③{근대 금융의 위기=신용•신뢰의 위기}?
④화폐의 새 질서를 요구한 비트코인

이들은 대체로 근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부채를 나눠 달리 보는 경향을 보인다. 근대 이후 은행 시스템을 통한 부채에는 힘과 권력에 의한 ‘폭력’이 내재해 있다고 본다. ‘화폐=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전의 부채는 물물교환을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엔 강제력을 띤 수단화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의 화폐론에서도 이런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다. 주류 경제학에서도 화폐는 물물교환거래의 불편을 줄이려 출현한 것으로 설명한다. 욕구의 불일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화폐다. 그러면서도 화폐의 조건으로 ‘최종 책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최종 책임 즉 권력=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다. 이 화폐의 ‘최종 책임’ 조건은 1930년대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나타난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폐의 가치는 정부의 조세부과 권한으로부터 보장되고, 가치의 안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유지한다”며 현대의 관리통화제를 설명한다.

| ▲ 미국 버지니아주 브레튼우즈에서 1944년 열린 브레튼우즈 회담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사진/브레튼우즈 연구소 |
1971년 미국이 마지막으로 달러의 금 태환을 정지한 후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가 됐다. 그 이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환율은 금과 연계해 고정했으나, 금 태환을 세계적으로 정지하면서 당시 경제력이 가장 뛰어난 미국의 화폐 달러가 그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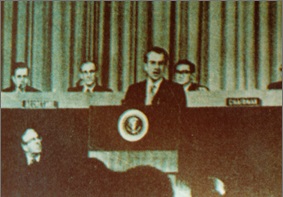 | |
|
◇ 신용 시대를 넘어 생태계적 가치의 시대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비주류의 화폐론에 상당히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논문에서 “(비트코인 시스템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어떠한 중앙 집중적인 권력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근대 이후의 은행 시스템과 관리통화제의 권력(권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
비트코인은 ‘정부의 권위로 발행하는 화폐(부채)’라는 개념에서 ‘정부’라는 존재를 없앴다. 당연히 화폐의 가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도 없다. 이 두 존재의 역할은 ‘네트워크’가 수행한다. 어떤 의지도 담지 않고 순수한 계산으로 화폐 발행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권력과 폭력의 산물로 보는 화폐라는 개념도 사실상 없앨 수 있다는 얘기다.
비트코인 예찬론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다. 인터넷과 IT가 발전하면서도 많은 디지털 통화가 나왔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았다. 기존 화폐의 틀에서 디지털 통화를 그렸기 때문이다. 기존 화폐의 일부 서비스이고 할인 쿠폰이고 팁(Tip)에 불과한 디지털 통화는 그저 보조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새로운 화폐 질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기술 진보에 따른 우연이건 아니건 간에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폭발력의 근원이다. 흔히 세상을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새롭다(Creative)’고 한다. 창조는 기존의 것을 갈아엎는 데서 출발한다. 프레임을 바꿔야 새로운 그 무엇이 나온다는 것도 같은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것’의 요소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암호기술연구실 이주영 박사는 비트코인의 가치와 관련해 ‘생태계적 가치’를 말한다. 화폐의 역사적 트렌드를 보면 금과 은 등 희소성에 가치를 둔 내재가치가 있었고, 국가 및 금융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한 안정성에 무게를 둔 신용가치로 발전했다.
이 박사는 “비트코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네트워크적인 새로운 글로벌 금융플랫폼을 제시하면서 생태계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것이 새로운 화폐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인터넷과 IT, 암호학 등의 상호 연관 발전을 토대로 생태계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평가했다.

| ▲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적 생태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