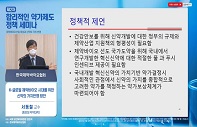정부가 세제 지원과 함께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사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 제약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운영기준 때문이다. 중소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도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발표했다. 퇴장방지약과 희귀약, 저가약 등을 제외한 급여 대상 1만7740품목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급여청구 내역이 있는 품목이 해당된다.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상한금액 인하율에서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2018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은 총 45곳으로, 외국계 제약기업 4곳을 제외하면 국내 기업은 41곳이다. 그러나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규모가 큰 11곳에 불과했다. 그 와중에도 매출액 상위권이면서 R&D 비용 500억원 이상이었다. 매출액 3000억원의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R&D 투자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한 4개 기업은 제외됐다.

또 R&D 투자 비율로 봤을 때 매출액의 10%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데도 규모가 작은 중소 제약사들은 매출 3000억원이라는 문턱에 걸려 아예 특혜기준에서 빠졌다.
LG화학은 대기업이지만 석유화학, 첨단소재의 매출을 제외하고 생명과학 부문으로만 봤을 때 지난해 매출액 5751억원, R&D 투자비용 1238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2%에 달했다. 이번 특혜 대상 기업 11곳 중 두 번째로 높다. 반면 한국콜마의 경우 제약업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산업의 비중이 높은데도 대형 기업의 면모를 내세워 약가인하율 50%를 감면받게 됐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매출에 약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년 조정되는 약가인하율을 줄일수록 수익성을 더 보장받을 수 있다. 매출이 커져야 연구개발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지만 사실상 중소 제약사들이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더 많이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2013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만든 취지는 R&D 활동에 기여 및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R&D 우대 ▲세제 지원 ▲약가 우대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마다 성향이 다른 만큼 지원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으로 매출을 창출하는 중소 제약사의 경우 약가 정책에서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 반대로 보유한 의약품이 없는 일부 바이오기업의 경우 R&D 비용 세액 공제나 정책자금 융자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R&D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제약업계도 혁신형 제약기업들마다 규모 차이가 큰 만큼 같은 선상에서 동등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도 골고루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출액과 R&D 투자 규모만을 봐서는 안 된다"며 "기업 규모에 맞게 얼마만큼 R&D에 투자하고 있는지 비중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