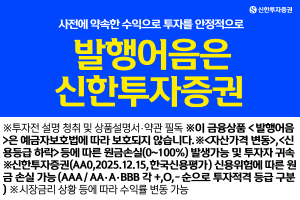BNK금융지주 회장이 내일(17일) 결정됩니다. 과거 같았으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방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CEO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유독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BNK금융지주 회장 유력 후보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때문입니다. 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부산은행 노조)는 김 전 부회장을 '낙하산'으로 지목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으로 정치권과 연이 닿은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기사☞회장 선임 앞두고 '외풍' 시달리는 BNK

금융권이 관심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분 한 주도 없는 민간 금융회사라 해도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꽂은' 사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MB시절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뜬금없이 KB금융지주 회장에 앉히는가 하면 이후 임영록 회장(관료 출신)이나 이건호 국민은행장(금융연구원) 등 KB금융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대표적이고요. 은행권이나 금융공기업 감사엔 금융 혹은 감사 경력이 전혀 없는 정치권 혹은 친박 인사를 선임한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우리은행 정수경 전 감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지난 10년간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정부에선 아직까지 뚜렷한 노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차관 인사나 청와대 인사만으론 새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공기업 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클 겁니다. 과거 정부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금융공기업 CEO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이렇게 새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를 해왔고 자연스레 인사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이번 BNK금융 회장 인선이 새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는 셈입니다. 예상대로 김지완 전 부회장이 새 회장으로 선임되면 이번 정부에서도 큰 기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도 외부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니까요.

오는 11월 임기가 돌아오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관심을 쏟는 이유일 겁니다. 사상최대 실적을 내고, 지난 9년간 1등을 차지했던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금융그룹을 되찾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게다가 호남(광주) 출신아닙니까. 여러모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연임의 키를 쥔 사외이사 사이에서도 당연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요.
하지만 어디 일이 항상 합리적으로만, 순리대로만 돌아가나요. BNK금융 회장 인선에 '낙하산'이 거론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으로 외부에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요. 이것이 낙하산 등 외부의 개입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우리은행도 마냥 안심할 순 없는 분위깁니다. 지난해 예보가 가진 지분 51% 중 30%를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매각해 사실상의 민영화를 했는데요. 예보는 여전히 18.78%를 가졌고, 단일 주주로는 최대주주입니다. 민영화했다고 축포를 터트리고 과점주주에게 힘을 실어줬던 상황을 생각하면,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지만 역시나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선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