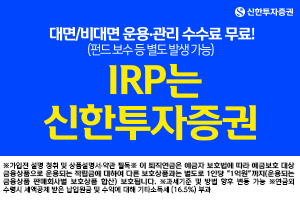출판사 오기 직전까지 다니던 회사의 회장 전화다. 그럴 줄 몰랐다는, 뜻밖이라는 목소리였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정말 운이 좋았다. 책 쓰려고 출판사에 간 것은 아니었다. 100세 인생이란 소리에 솔깃했다. 남은 50년은 뭘 하면서 살지? 글 만지는 일로 보내고 싶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
돌아보면 글 쓰는 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글을 써서 25년 간 월급 받고 살고, 지금은 이곳저곳에서 글쓰기 강의도 한다. 과분한 호사다. 내게도 염치란 게 있을 터. 누군가 ‘당신이 글에 대해 뭘 알아?’라고 물으면 ‘나도 이 정도는 노력했다.’고 대답할 말이 필요했다.
글쓰기는 생각 쓰기다. 생각은 저절로 나기도 하지만, 자극이 필요하다. 독서와 토론과 학습과 관찰이 생각을 촉발시킨다.
첫 번째, 독서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사색의 대용품이 독서라고 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 하지만 책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사주신 제목 미상의 글짓기 책 한권을 닳도록 읽었다. 독후감, 일기 등 종류별로 잘 쓴 글을 모은 책이었다. 그 책 덕분에 글짓기 대회가 기다려졌다. 중고교 때는 이모 집에서 살거나 입주과외를 했다. 이모부는 시인이셨고 입주한 곳은 서점이었다.
둘째, 토론이다.
‘100분토론’ 같은 거창한 토론이 아니다. 수다도 좋다. 횡설수설 주정도 나쁘지 않다. 사람은 말하면서 생각한다. 들으면서 생각이 난다. 토론은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운다. 설득력을 키우는 데도 토론이 최고다. 대학 다닐 때 거의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학교 건너편 관악산 입구에서 파전에 막걸리를 마셨다. 술이 얼큰해지면 예외 없이 신림 사거리로 진출했다. 격렬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내가 밀렸다 싶은 날은 집에 가 칼을 갈았다. 얘기할 거리를 미리 준비하고, 다음날 술자리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힘이 커져 갔다.
셋째, 학습이다.
수업은 등한시했다.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구석구석 찾아다녔다. 거의 매일 학내 시위를 참관(?)했다. 대자보를 읽으며 공부했다. 종교행사도 기웃거렸다. ‘도를 아시냐’고 물으면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체험학습을 했다. 나중에 보니 이 모두가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양분이었다.
넷째, 관찰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보여야 생각하기 시작한다. 관심이 생각의 출발점이다. 나는 신문 부음을 열심히 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부음이다. 돌아가신 분이 무엇을 했고, 그 자녀들이 뭘 하고 사는지 알아보는 게 흥미롭다. 기사 중에는 인터뷰 기사가 가장 재미있다. 술을 마시면서도 옆자리 얘기가 궁금하다. 그 사람들 얘길 듣는 데 정신이 팔린다. 이 때문에 아내에게 자주 핀잔을 듣는다. 길을 걷다가 50대 남자와 눈이 마주친다. 혼자 편의점에 앉아 퍽퍽하게 보름달을 먹고 있는 남자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슬프다. 눈물이 핑 돈다.
끝으로, 메모다.
써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써놓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린다. 생각나는 것은 무조건 써놓아야 한다. 써놓아야 비로소 자기 생각인 것이다. 어릴 적부터 메모하는 걸 좋아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형과 함께 부여에 갔다. 수첩을 챙겨온 걸 보신 아버지가 칭찬하셨다. 대신, 형에게 미움 받았다. 그래도 꿋꿋하게 메모했다.
눈을 씻고 찾아보니 나름 준비 많이 했다. 거저 공짜로 주어진 25년은 아니었다. 내 인생 날로 먹지 않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