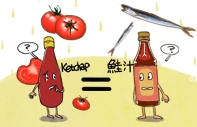버터는 서양에서 건너 온 낙농제품이다. 우리가 버터를 국산화한 것은 1968년 무렵이다. 이전에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버터나 소량의 수입품을 먹었다. 그렇다고 옛날에 버터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이나 고려시대에도 버터는 있었다. 다만 너무나 귀한 식품이었기에 일반인은 구경도 못했을 뿐이다.
조선시대 버터는 임금이 먹는 보약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이 버터 생산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자 훗날 집현전 부제학을 지낸 윤회가 버터 생산중단을 반대하고 나섰다.
“수유(酥油)는 임금님 약으로도 쓰고, 때때로 늙어 병 든 신하에게 나눠주는 것이니 생산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린다. 참고로 윤회는 임금으로부터 “그대가 알 바 아니다”라는 핀잔 비슷한 대답을 들었는데 이유가 있다.
세종이 버터 생산을 중단하려고 한 까닭은 나중에 이야기하겠고 윤회가 말한 수유(酥油)가 바로 지금의 버터다.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티베트 등지에서 찻잎 끓인 물에 버터와 소금을 넣은 전통차인 ‘수유차’를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수유차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버터차가 된다.
우유가 귀했던 고려와 조선에서는 버터인 수유가 거의 약으로 쓰였다. 성종 때 인물로 좌의정을 지낸 이행이 조선이 온 중국사신을 맞이해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쇠약한 몸 지켜주는 것은 오직 버터(酥油)뿐”이라고 노래한다. 버터가 보약 이상의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림경제’에도 구기자차에 달인 수유를 넣고 소금을 약간 쳐서 끓여 마시면 몸에 아주 좋고 눈도 밝아진다고 약효가 적혀 있다.
버터가 조선에서 이렇게 귀한 약재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생산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은 농경사회였으니 우유 생산량이 적게도 했겠지만 제한된 우유로 보양식인 우유죽(駝酪)도 끓이고 치즈(乳酪)도 만들며 버터(酥油)도 생산해야 하니까 주로 왕족이나 양반의 약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약재인 버터의 생산을 세종이 중단키로 한 것은 지나친 사치품이기 때문에, 혹은 버터를 생산하느라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엉뚱하게 병역기피 때문이었다.

| ▲ 삽화: 김용민 기자 kym5380@ |
조선 초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버터를 만든다는 핑계로 군대를 가지 않았던 모양이다. 버터가 병역기피의 도구로 악용됐던 것이다. 자세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 세종 3년(1421년)의 기록에 나온다.
“수유치(酥油赤)을 폐지했다. 황해도와 평안도에 수유치가 있는데 스스로 달단(韃靼)의 유민이라고 하면서 도축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해마다 가구당 수유를 궁중 주방에 바치도록 하고 병역을 면제해 주었는데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지내면서 수유는 바치지 않고 군대만 빠지고 있다”
달단은 서역의 타타르족으로 버터를 생산하는 달단의 후손들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었던 것인데 조선 사람들도 그것을 악용해 달단인 마을로 옮겨가 군대를 빠졌던 모양이다.
그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가구에서는 군대도 가지 않으면서 몇 해 동안 한 번도 수유(버터)를 바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어떤 가구는 한 집에 남자만 21명이나 있는 집도 있었다고 한다. 세대 등록만 해놓은 것이다. 이러니 속된 말로 세종대왕이 열 받을 만도 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인간 꼭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