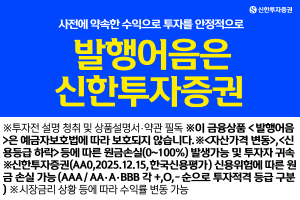새해 백화점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롯데백화점입니다. 라이벌 신세계 출신 정준호 대표가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통'입니다. 정 대표는 인트라넷을 통한 취임 인사 이후 임직원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인용하며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죠. 이런 정 대표의 글에 댓글을 다는 직원도 늘고 있습니다. 보수적 이미지였던 지금까지와의 롯데백화점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취임 6주가 지난 후, 정 대표의 '첫 작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직개편입니다. 롯데백화점의 3개 '지역본부'를 통합하고, 식품부문을 대표 직속으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패션부문은 세분화됐습니다. 명품부문은 브랜드·의류와 시계·쥬얼리 등 3개 부문으로 나뉘고요. 남성스포츠부문 역시 남성패션·스포츠·아동 등으로 분리합니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가 책임졌던 아웃렛은 따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인력 운영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각 부문장에 젊은 차·부장급을 승진 발탁합니다. 2~3년씩 순환근무하기보다, 좋은 인재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외부·여성인사 발탁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명품 브랜드를 두루 거친 현 명품 기업 대표 영입을 시도하고, 경쟁사의 인재들도 활발히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의 노림수는 뭘까요. 먼저 조직개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업계에서 조직이 가장 큽니다. 5개 부문, 3개 지역본부로 구성돼 있죠. 반면 경쟁사인 신세계·현대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고작 3개, 현대백화점은 5개 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신세계·현대백화점은 영업본부가 모든 점포를 관할합니다. 반면 롯데백화점은 각 지역본부 아래에 몰·아웃렛 등 지역 내 모든 점포를 배치해 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왜 이렇게 '뚱뚱'했을까요. 점포가 너무 많은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아웃렛 등을 포함한 롯데백화점의 전국 점포 수는 60여곳에 달합니다. 반면 신세계·현대백화점의 전국 점포는 약 20곳 안팎이죠.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는 분산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지역본부 한 곳만 해도 경쟁사 규모니 말입니다. 이 전략은 오프라인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효과적이었습니다. 누구나 백화점 입점을 원하고, 뭘 팔아도 잘 팔리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며 지역본부 체제는 비효율의 온상이 됩니다.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명품 등 브랜드 라인업과 체험이 백화점의 경쟁력이 됩니다. 변화를 위해 더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도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이런 흐름을 쉬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보수적 기업문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악영향을 줬지만, 지역본부와 본사라는 '옥상옥' 구조도 한 몫을 거들었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 롯데백화점의 지역본부는 아웃렛 등도 관리했습니다. 백화점과 아웃렛은 '다른 산업'입니다. 전략·브랜드·마케팅 등의 업무 시스템과 시장 환경도 차이가 분명하죠. 이는 내부의 업무 부담을 높입니다. 더불어 입점을 시도하려는 셀러도 번거롭게 만들죠.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롯데백화점의 조직개편은 혁신보다 정상화에 가깝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다이어트'를 한 셈입니다.
다만 구체적 운영 전략에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정 대표는 식품부문을 대표 직속으로 배치했습니다. 왜일까요. 식품은 백화점 성공의 '필수 요소'중 하나입니다.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식품만큼 효율적인 수단도 없으니까요. 실제로 국내 1등이자 세계적 백화점이 된 신세계 강남점은 엄청난 식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점포 핵심 경쟁력으로 식품을 앞세우고 있고요. 반면 롯데백화점은 '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옅은 것이 사실입니다.
명품 집중 전략도 살펴봐야 합니다. 명품은 늘 롯데백화점의 약점으로 꼽혀 왔습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은 신세계·현대백화점에 비해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에루샤)를 모두 갖춘 점포가 적죠. 이는 구매력 높은 명품 고객이 롯데백화점을 외면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롯데백화점은 절대적 매출 규모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면서도, 각 점포의 내실은 다소 떨어졌죠. '대중 백화점'이라는 달갑지 않은 칭호가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 대표의 목표는 '보완'입니다. 조직 슬림화와 전문성 강화는 여태껏 지적돼 온 롯데백화점의 '단점'을 없애기 위한 시도죠. 이는 '경험'에서 나온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외부에서 롯데백화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온 인물입니다. 신세계 강남점의 성장을 지켜본 만큼 백화점의 '성공 방정식'도 알고 있을 테고요. 이 경험이 롯데백화점의 고향인 본점만큼 잠실·강남점에 집중해 '강남 1등'을 노리고, 과감한 내부 쇄신을 선택한 자신감의 바탕일 겁니다.
그렇다면 롯데백화점은 '장밋빛 미래'를 꿈꿔도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고착화된 이미지를 바꾸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롯데백화점은 오래된 점포가 많습니다. 체험 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경쟁사보다 부족합니다. 정 대표가 강조한 잠실·강남점도 비슷하고요. 젊은 고객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 명품은 이미 백화점 업계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명품통' 손영식 대표를 선임하기도 했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내부 관리도 남은 과제입니다. 일단 변화에 대한 롯데백화점 일선 직원들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자가 이미 진용을 갖춘 상황에서 완전히 새 판을 짜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명품 집중 등 사업 전략의 전환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롯데백화점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노하우도 함께 가져가야 진짜 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롯데백화점은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큰 틀이 바뀐 만큼, 결과도 어떤 방식으로든 바뀔 겁니다. 롯데백화점은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또 롯데백화점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사는 어떤 전략으로 맞설까요. 이것 노력들이 한데 아우러져 백화점 시장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정 대표는 취임사에서 "롯데백화점을 다닌다는 말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