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금융권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 타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정기적인 은행 혁신성평가와 함께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해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은행별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창조금융에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이 본업인 은행에 투•융자를 강요하고, 부실 면책 범위는 확대해 부실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첫 혁신성평가 신한은행이 1위
금융위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실시한 은행 혁신성평가 항목은 기술금융 확대(40점)와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 크게 세 부분이다.
첫 평가에선 세 항목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은 신한은행이 82.65점으로 종합 1위에 올랐다. 우리(76.8)와 하나(72.7), 외환(66), 농협(63.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은 59.4점으로 대형 시중은행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다. 외국계인 SC(49.2)와 씨티(44.5)가 꼴찌였다.
지방은행 중에선 부산(79.2)과 대구(76.7), 경남(70.45)이 상위권에 올랐다. 항목별로는 기술금융에선 신한과 우리, 부산과 대구, 경남은행이,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에선 신한과 하나, 부산, 대구은행이, 사회적 책임이행에선 신한과 부산, 대구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는 “은행 혁신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도 낮아 경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 ▲ 혁신성평가 결과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교 |
◇ 임원 성과평가체계도 대폭 개선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안도 내놨다.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KPI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술금융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KPI에 기술금융 취급실적과 잔액, 신용대출 비중 등 기술금융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술금융 실적엔 120~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KPI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PKI는 혁신성평가 결과에 따라 연동된다. 반영 비중은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면 혁신성평가 결과에 은행장과 부행장의 성과급이 최대 12%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 여신 부실에 따른 면책 범위 확대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책임 부과시스템도 개선한다. 특히 중소기업 여신 관련 면책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여신 심사 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대출 취급 단계에서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후 5년 이상 지나면 더는 책임을 묻지 않는 ‘징계시효’ 제도도 운용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보수적이고 낡은 관행을 끝까지 혁신해 자금중개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은행 혁신성평가를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실효성 논란에다 코드맞추기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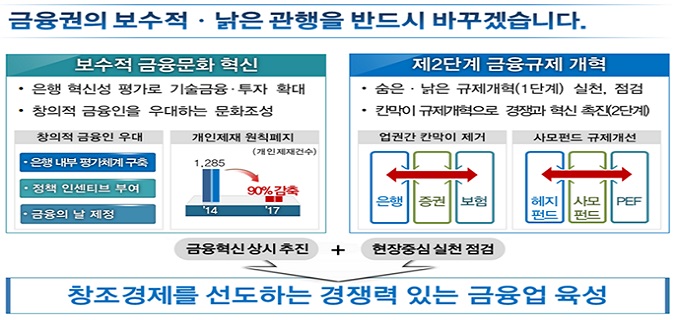
은행 혁신성평가와 성과평가체계 개선안은 기술금융 확대와 함께 같은 연장선에서 보증과 담보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보증기관 출연료를 깎아주고, 임원 성과 평가에서 가산점을 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반면 실효성 논란과 함께 코드맞추기란 비판도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지적한 후 보여주기식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꾸준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별 특성을 무시하고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대출만 강조하다 보니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기존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포장만 바꾸거나 무리하게 기술금융 대출에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는 좋지만, 일방적으로 실적만 요구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되거나 고스란히 부실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