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때마다 외풍에 시달려온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는 내년에 또 한번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앞날도 전망이 쉽지 않은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윤 회장의 임기는 내년 11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번 정권 막바지에 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조기대선이 유력해지면서 대선이 끝난 후에 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윤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윤 회장의 연임이 자연스럽지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외풍이 불 수도 있어서다. 윤 회장 입장에선 연임을 위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말고는 어떤 예측도 무의미한 상황이 되고 있다.

◇ 은행장 선임 잠잠...더 큰 불확실성 몰려온다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는데도, 매번 외부 입김에 시달렸던 KB금융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올랐다. 실제 윤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늘 행장 분리(혹은 선임) 압박을 받아야 했다. 불과 한두 달 전만해도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진 정치권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한동안은 이런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B금융 안팎에선 낙하산 은행장을 잘 막아낸다는 전제하에 내년 윤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는 시점에 행장직을 분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쯤이면 은행도 안정되고, 후계구도도 견고해지면서 회장직과 은행장직의 겸임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경우 정권 초기 윤 회장은 임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엔 늘 그랬듯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활개를 치는 시기다. 윤 회장이 호남 출신이고, 이번 정권에서 설움(?)을 당했다하더라도 정권 교체 이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 거취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KB 이익 기반 확대‥내년 신한 추월 확실시
점점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윤 회장(55년생)은 연임을 위한 명분을 쌓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2년 전 취임일성으로 내놓은 것이 리딩뱅크, 리등금융그룹 회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 회장의 향후 후계구도 경쟁은 내부의 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56년생)이나 전현직 계열사 사장보다는 오히려 8년간 1등을 지킨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애초부터 한 3년을 예상했다"면서 "꼭 따라잡자는 것보다는 이익 변동성이 크지 않고, 우리보다 자산 등 사이즈가 작으면서도 이익을 많이 내는 점이나 비용관리 등의 측면에서 배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올해 4분기 현대증권 잔여지분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을 반영하게 된다. 대략 8000억원 안팎의 순이익 증가 효과를 얻고 이 경우 신한금융을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회계상 이익이면서 일회성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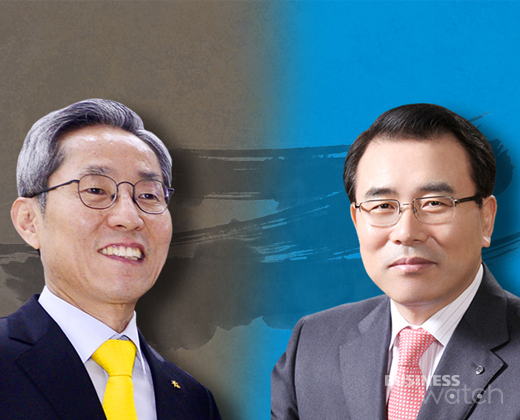
| ▲ 윤종규 KB금융 회장(왼쪽)과 조용병 신한은행장(그래픽/유상연 기자) |
그런 면에서 내년이 본게임이 될 전망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현대증권의 순이익이 100% KB금융의 이익으로 반영된다. 내년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 추가 지분인수로 이익 기여도가 커지면 2조원 수준의 순이익은 거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은행 역시 그동안 보수적인 충당금 정책 덕분에 내년 이후 충당금 환입 등으로 신한은행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신한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임원회의에서도 간혹 언급되는데, 내년엔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무리하게 대응하지는 말자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 내부에서는 윤 회장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신한을 의식하는 데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한금융 또 다른 관계자는 "회계사 출신으로 숫자에 밝은 점은 경쟁력"이라면서도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기보다 원 펌(One Firm)을 강조한 것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신한을 뒤쫒는 미투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멈춰버린 해외진출 시계 '약점'
앞서 윤 회장은 현대증권 인수로 그룹의 인수·합병(M&A) 흑역사를 확실히 깨부쉈다. 무엇보다 그룹의 숙원인 비은행 강화를 단번에 이뤘다. 내년 임기에 맞춰 8년간 빼앗겼던 1위 자리를 되찾으면서 윤 회장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현대증권 인수 과정에서 KB금융 이사회가 윤 회장에게 사실상 '백지위임'을 해줬듯 이사회의 신뢰도 확보했다.
다만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의 화두이자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윤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이다. 국민은행의 해외 네트워크(사무소 포함)는 12월을 기준으로 11개 국가, 18곳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이 20개국 147개, 우리은행 25개국 237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한 것을 고려하면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초라하다. 특히 다른 은행이 해외 점포를 본격적으로 늘린 시점이 최근 2년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실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 2014년 말 이후 각각 77개, 164개를 늘리는 사이 KB는 상해분행(2015년) 한 곳만 늘었을 뿐이다. 윤 회장은 올해 초 미얀마 은행 진출에 공을 들였지만, 신한은행에 선수를 뺏기기도 했다.
물론 지난 2008년 인수한 카자흐스탄 BCC로 최근까지 1조원 가까이 까먹은 여파가 컸다. 8년이 지났지만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은행의 한참 뒤처진 해외진출 전략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쟁은행들이 미래 이익 창출구로 삼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또 이를 단숨에 따라잡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KB의 경쟁력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나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