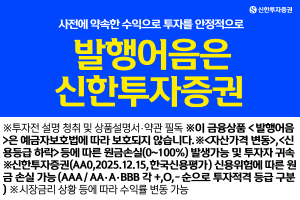연말이 되면 주목받는 금융상품이 있다. 연금이다. 조기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노후를 경험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위다. 이는 2위와 약 2배 차이나는 수치로 심각한 지경이다. 이를 볼 때 연금은 50대 이상의 관심을 끌 것처럼 예상되지만 의외로 2030세대도 주목한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등은 연말 정산 시 세제혜택이 존재하기에 당장 절세도 받고 한국의 심각한 노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젊은 세대가 연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절세가 더 클 것이다.
이 때문에 연말 정산 시기가 도래하면 매번 연금관련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최근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읽었다. 20년 간 매월 40만원씩 납부하면 사업비만 1152만원이 차감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총 납입 보험료의 10% 정도가 사업비인 셈이다. 물론 '변(變, 변할 변)'액 보험의 가치는 그것이 연금이든 종신이든 투자 수익에 따라 변한다. 사업비가 높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이를 상쇄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상품 설명 시 사업비는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매번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를 지적하는 보도가 등장하면 다른 보험도 선취 수수료로 인해 신계약비가 많이 필요하여 사업비가 높다는 항변이 주를 이룬다. 가령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와 연금보험의 사업비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강조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변액연금보험이든 변액보험이든 동일한 범주의 보험종목끼리 묶어 어디 사업비가 저렴하다고 논하는 것도 자칫 위험할 수 있다. 보험 상품 이외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보험은 하나의 선택지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변액연금보험까지 '연금'이란 이름이 붙은 보험 상품군 간 비교도 필요하겠지만 연금저축펀드 등 보험 상품 외 타 금융 상품과의 적절한 비교도 필요하다. 더 좋을 수 있는 대체재가 존재할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여러 기준에서 객관적 비교를 해줘 그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일이 공정하고 합당하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매번 생략된다.
물론 공정한 비교의 책임을 보험 상품의 모집 주체인 설계사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모집 수수료는 설계사의 소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객관적 비교를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은 개별 소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공정한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합성의 원칙이나 적정성의 원칙을 근거로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 금융 상품의 객관적 비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따라서 변액연금보험 간 사업비나 수익률 비교는 무의미할 수 있다. 보험 상품 내외적으로 동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와의 수익률이나 적용금리, 사업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객관적이라 함은 모집이나 판매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제3의 존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이 역할을 감독기관 등이 나서야 한다.
금융자본주의에 포섭된 현대인에게 금융문맹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러 연금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 개념조차 잡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 배우고자 해도 공신력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르쳐주는 존재도 부재하다. 비교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객관성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고 이는 제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연말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를 지적하는 보도가 반복되고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는 것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현실을 볼 때 아쉬움이 크다. 인구구조 변화로 공적연금의 불신이 높아져 개인연금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공정한 비교를 행할 감독기관의 존재를 기대해 본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