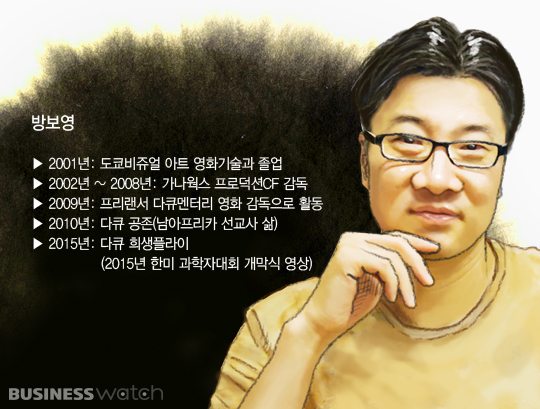어릴 적 학교 운동장은 너무 넓었다.
달려도 달려도 끝자락은 멀기만 했다.
어른이 된 뒤 다시 찾은 바로 그 운동장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져 있었다.
스승의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선생님이란 단어를 한 번쯤 떠올리는
바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 한쪽엔 넓었던 운동장만큼이나 컸던
선생님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하나쯤은
누구나 남아있다.

석복순 씨와 김명희 씨는
서울교육박물관에서 해설봉사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60년 가까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먹고살기 힘들었는데
교실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은 다들 눈을 감긴 뒤
돈을 가져간 친구는 손을 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자 솔잎을 가져와
다들 입에 물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솔잎이 자라나니
다 알 수 있다면서 다시 손을 들라고 했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돈을 가져간 친구가 겁이 나 솔잎을 잘랐고
선생님은 따로 그 친구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학생을 보호해 줬던 거죠.

김명희 봉사자는 교권이 사라진
교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선생님이 오히려 학생을 무서워해요.
결국 가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엔 선생님을 존경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배웠던 것 같아요."

채동희, 조유빈 학생은 숙제를 위해
홍대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다.
두 학생은 담임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저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아니까 힘들어도
모두가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김영란법 탓에 카네이션은 드릴 수 없어도
손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반 친구들과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권강민 씨는 합정동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한다.
17년 전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아버지도 이발소를 운영했어요.
그 길을 따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버지를 따라
가업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사용하던
가위와 빗을 보관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늘 단정한 모습으로
일터인 이발관으로 출근했어요.
어렸을 적 봤던 아버지 모습을
저도 순간순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제 일이 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일이잖아요.
자신감을 심어주는 직업이라 생각해요."

| ▲ 경기도 고양 동산고등학교 양유진 양(맨 오른쪽)과 친구들 |
스승의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억의 먼지 속에 덮여있던
선생님이란 단어를 꺼내지만
참되거라 바르거라 그 가르침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