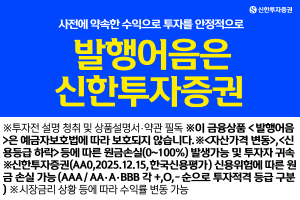류 워셤(Lew Worsham)이 누군지 아는가?
안다고?
대단한 독자다. 나 대신 이 자리에 칼럼을 써도 될 만큼 골프에 대해 넓게 알고 있는 것이 틀림 없다.
류 워셤을 모른다고 해도 샘 스니드(Sam Snead)는 알 것이다?
그렇다. 미국프로골프투어(PGA)에서 82승을 거둔 전설적 골퍼 샘 스니드 말이다.
타이거 우즈와 같은 최다승 기록을 갖고 있는 그 스니드. 물론 오늘 얘기 주인공은 스니드가 아니다. 워셤이지.
워셤은 샘 스니드와 같은 시대 골퍼다. 샘 스니드를 바싹 긴장하게 만든 몇 안 되는 그 시대 최고 실력파 중 한 명이다.
올해는 워셤이 73세로 세상을 떠난지 10년 되는 해다.
골프 월드에 사는 우리는 그를 기려야 한다.
왜냐고? 그가 바로 오늘의 골프 월드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골퍼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명승부로 말이다.
TV가 없던 시절 골프는 어땠을까? 그랬다. 라디오로 중계했다. 신문에 뉴스로 나오거나.
신문은 주로 결과만 다뤘다. 물론 승부처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얘기를 제법 자세히 쓰기도 했다. 그래도 우승을 다투는 몇몇 대선수 얘기만 다룰 수 밖에 없었다. 지면 한계가 있으니까.
라디오는 조금 나았다. 18번 홀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방송 부스를 만들고 내다 보며 중계를 했다. 물론 조별로 홀마다 성적이 들어오면 알려주면서.
중계를 하거나 기사로 다룬 그 코스를 돌아본 골퍼라면 라디오 방송만 듣거나 신문에 실은 글만 보고도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하지만 골프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같은 것이었다.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
그러다 마침내 골프 대회를 TV로 중계했다. 맨 처음 방송을 한 것은 1947년 US 오픈이다. 그 경기는 대회장인 세인트 루이스 컨트리클럽이 있던 지역에서만 방송했다.
바로 이 대회에서 류 워셤은 샘 스니드와 연장전을 치렀다.
당시 US오픈 연장전은 18홀 한 라운드를 더 돌았다. 나흘 내내 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해 하루 더 겨뤘다는 얘기다. 그것도 최초로 TV로 중계된 대회에서 말이다.
바닥난 체력을 정신력으로 버티며 두 선수는 엎치락뒤치락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워셤이 마지막 홀 버디를 잡아내면서 한 타 차 승리를 거뒀다. 다른 사람도 아닌 스니드를 물리치고 말이다.
그날 워셤이 졌다면 타이거 우즈는 아직도 PGA 최다승 타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뻔 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흘러 1953년이 됐다. 그 사이 방송 기술도 좋아지고 미국 전역에 TV 대수도 늘었다.
그 해 ‘월드 챔피언십 오브 골프’는 ‘골프 대회로는 최초로 미국 전역에 방송’했다. 그것도 생중계였다. 물론 카메라가 홀마다 선수를 따라다닐 정도로 방송 환경이 좋지는 못했다. 카메라는 18번홀 퍼팅 그린만 비췄다. 방송 시간도 한 시간뿐 이었고.
다시 한 번 류 워셤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전날까지 선두여서 마지막 조로 플레이 한 워셤은 선두에 한 타 뒤진 채 마지막 홀에 들어섰다.
그 홀에서 버디가 필요했다. 공동 선두가 돼서 연장전을 치르기 위해서 말이다.
워셤이 친 세컨샷은 한 번 튀더니 홀을 향해 굴렀다. 그리곤 홀로 빨려 들어갔다. 이글이었다. 연장전에 갈 필요도 없이 그대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것도 최초로 미국 전역에 생 중계한 대회에서 말이다.
이 장면을 고스란이 TV가 중계했다. 미국 시청자들은 흥분했다. 골퍼라면 미쳐 날뛸 정도였다. 골프를 잘 모르는 시청자도 흥분했고.골프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뒤로 골프 대회를 후원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었다. 더 많은 대회를 TV로 중계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대회 우승 상금도 급등했다.
1947년 US 오픈을 우승하고 워셤이 받은 상금은 2천 달러였다. 물론 당시에도 제법 큰 돈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PGA 투어 우승 상금은 100만달러가 무조건 넘는다.
류 워셤. 나는 그가 만들어낸 명승부가 지금의 골프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라. 최초로 미국 전역에 TV로 생중계한 대회에서 그것도 마지막 날 마지막 홀에서 이글로 단숨에 승부를 뒤집고 우승을 하다니. 가슴 뛰지 않는가?
김용준 프로 & 경기위원(KP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