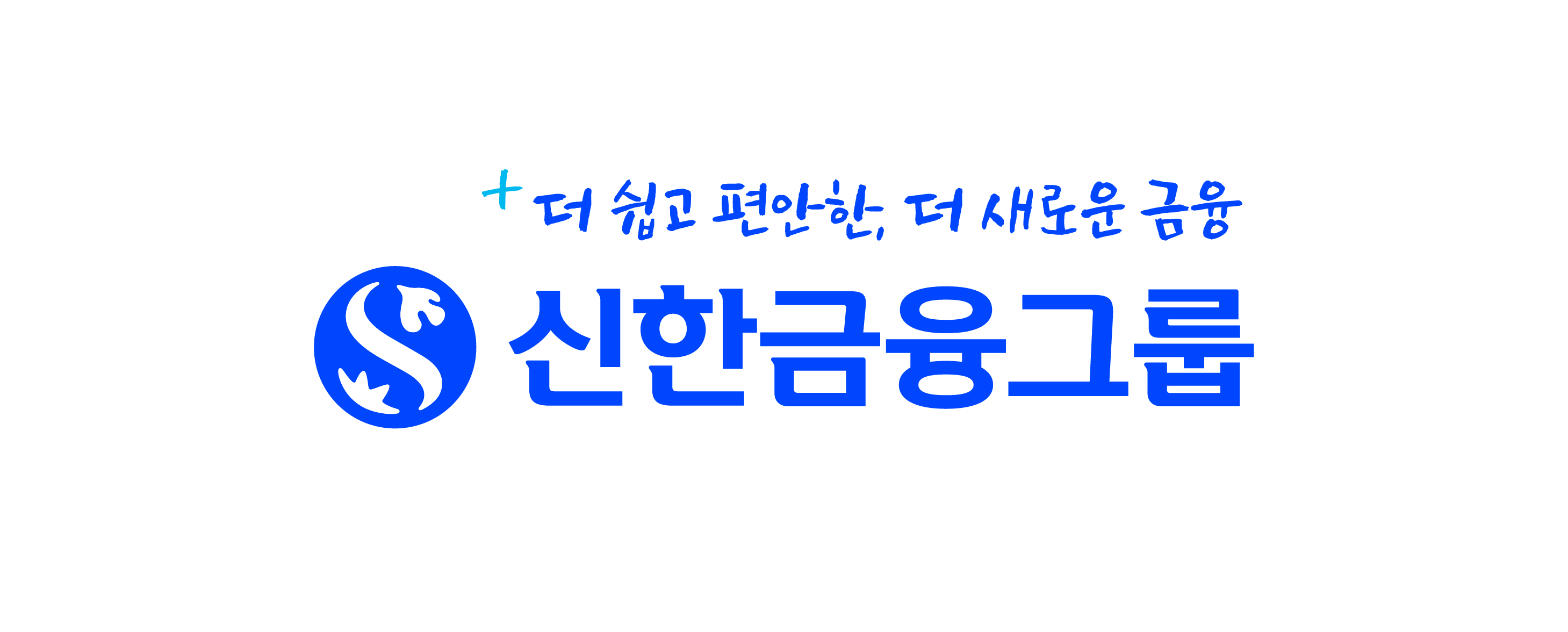뷰티업계에 5000원 이하 '초저가' 시장이 열리고 있다. 다이소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1000~5000원대 제품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불황에 지친 소비자들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다만 겉으로는 '초저가'에 무게를 둔 점이 비슷하지만 방향성은 완전히 다르다. 다이소가 원가 절감을 통한 '코스트 다운'에 집중했다면 편의점은 용량을 줄인 '샘플링'이 핵심이다.
안 파는 게 없다는 이 곳
최근 뷰티업계의 화두는 '다이소 뷰티'다. 5000원 이하 초저가 제품을 앞세워 2만~3만원대 제품들이 이끌던 뷰티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00㎖ 샴푸나 바디워시는 5000원, 150㎖ 클렌징폼은 3000원이면 살 수 있어 고가의 더마 화장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다이소는 소비자들이 저가 화장품에 갖는 인식도 크게 바꿔놨다. 일반적으로 저가 화장품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는 제조사의 제품인 경우가 많다.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을 받을 통로도 마땅치 않다. '싼 게 비지떡'이었다.

하지만 최근 다이소에 입점하는 뷰티 제품들은 국내 정상급 브랜드들의 세컨드 브랜드들이 즐비하다. 국내 화장품 시장을 이끄는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마몽드의 세컨드 브랜드인 '미모 바이 마몽드'를 론칭, 다이소 입점 4개월 만에 100만개 이상을 판매했다. LG생활건강도 생활용품 브랜드 온더바디의 세컨드 브랜드인 '퓨어더마'를 론칭해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사실상 '다이소 전용 브랜드'다.
편의점 업계도 다이소와는 다른 이유로 초저가 뷰티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편의점들은 일찌감치 다양한 뷰티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판매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기존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 매대에 올려놨을 뿐이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도, 타깃도 없는 구색 맞추기용 상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편의점의 접근성과 가성비 콘셉트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뷰티를 신성장 카테고리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U는 세럼과 크림을, GS25에선 마스크팩과 올인원 로션, 이마트24는 에센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화장품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세븐일레븐은 뷰티에 특화한 매장을 열기도 했다.
같지만 다르다
다만 같은 가성비 제품군이더라도 다이소와 편의점은 방향성이 다르다. 편의점의 주 고객은 고가 화장품 구매에 부담을 느끼지만 정체 모를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는 않은 1020이다. 다이소가 택한 '대용량 초저가' 전략도 잘 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편의점의 뷰티 카테고리 전략은 '초저가 샘플링'에 가깝다. '괜찮은 제품을 저렴하게 몇 번 사용해 보고, 마음에 들면 본품을 구매하라'는 식이다. 최근 편의점들이 내놓는 뷰티 신제품들을 보면 알기 쉽다. CU는 올 초 소용량 파우치에 립틴트, 립글로스 등을 담은 상품을 출시했다. 3000원짜리 파우치형 립틴트는 개당 3㎖의 소용량이며 1500원짜리 올인원 스킨로션은 3~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15㎖다.

이달 GS25가 출시한 기초화장품과 바디용품 역시 비슷하다. GS25는 더마비와 손잡고 전제품 3000원짜리 라인업을 선보였다.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이 30㎖, 리얼 베리어 크림은 10㎖ 구성이다. 이 역시 5일 안팎으로 사용하기 좋은 양이다. 이런 전략은 해외 편의점에서는 일반적이다.
다이소의 뷰티 매대가 올리브영이나 브랜드 자사몰과 직접 경쟁하는 채널이라면 편의점은 뷰티 브랜드들이 경쟁할 수 있는 광고 채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다이소의 경우 가격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가 절감이 들어가지만 샘플링의 경우 다소 가격이 높은 제품이라도 본 상품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

업계에선 로드숍의 몰락, 롭스·랄라블라 등 경쟁 H&B스토어의 철수 이후 올리브영이 독점하고 있는 오프라인 뷰티 채널에서 다른 방식으로 올리브영을 견제할 수 있는 채널이 나타난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다. 올리브영 이상의 유통망과 소싱력을 갖춘 다이소·편의점이 각자 다른 콘셉트를 앞세워 제품군을 확대한다면 뷰티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다이소는 올리브영과 점포 수가 비슷하고 편의점은 5만개가 넘는다"며 "채널 특성에 맞는 제품들이 늘어나면 제품도 다양해지고 채널 간 경쟁으로 품질·가격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