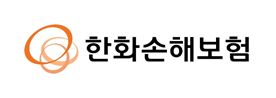최근 금융권 인사를 보면 누가 더 센 동아줄을, 먼저 잡느냐가 포인트다. 예전 같으면 이 동아줄은 대개 금융당국에서 내려왔다. 이젠 정치권, 혹은 청와대에서 내려준다. 官治의 시대에서 政治의 시대다. 정치가 득세하면서 금융 경력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들어앉았다. 신뢰와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금융회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곪아 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없는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보이지 않는 손은 항상 있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었고, 지금은 그 범주가 관(官)에서 정(政)으로 넓어지면서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절차도 관례도 무시한 채 막강한 힘을 떨친다. 이 과정에서 관은 정의 뜻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아바타'로 전락해버렸다.
지금 금융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사 행태들을 보면 그렇다. 금융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적인 성격을 띤 은행권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낙하산 인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것이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관치에서 정치로 옮아가면서 금융회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데 있다. 이는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융회사 인사에 소위 '말발'이 전혀 먹히질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KB금융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LIG손보를 인수해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고 했다. KB금융에 대한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명분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얘기가 금융당국에서 밀었던 인사가 낙마하면서 보복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KB금융 사외이사들이 관치에 굴하지 않고 내부출신인 윤종규 회장을 뽑았다는 얘기인데, 이 역시도 들여다보면 관보다 윗단인 청와대의 뜻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경재 당시 이사회 의장이 '뉴 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영(?)을 받들어 당국에서 밀었던 하영구 현 은행연합회장 대신 윤 회장에 표를 밀어줬다는 것이다. 관치가 아닌 정치가 작용했다는 얘기다.
이광구 부행장 내정설이 굳어지고 있는 우리은행장 선임에서도 마찬가지다. 애초 금융위가 청와대에 올린 인사검증 대상에 이 부행장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에만 해도 이순우 행장의 연임이 당연시됐고 민영화 실패가 있었지만 '팔리는 은행'의 수장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어서 큰 결격사유가 되진 않았다.

금융회사 수장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금융회사 감사 자리마저도 정치권에서 날아온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생전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허다하다.
지난달 말 사표를 낸 문제풍 예금보험공사 감사는 새누리당 서산·태안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최근 선임된 한국예탁결제원 정경모 감사는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서울시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지냈고, 우리은행의 정수경 감사도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친박연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공명재 수출입은행 감사, 이수룡 기업은행 감사 등도 모두 새누리당이나 대선캠프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대부분이 내세울 만한 금융 경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금융회사에서 관치가 낫다거나 관료 출신이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경험해보니 그나마 관치가 낫다"며 "고위 공무원들은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기본은 하는데, 정치 쪽에서 온 낙하산은 정말 이도 저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관치가 철저히 배제되면서 금융회사 감사자리 하나마저도 금융당국에서 정할 수 없는 처지다. 대신 정치권에서 찍어준 인사들을 꽂아주고 정리해주는 아바타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광구 부행장 내정설이 불거지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금융당국이 이순우 행장의 연임 포기를 압박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에 관해 물어보면 "(금융당국 내)ㅇㅇ한테 물어봐"라고 했지만, 이젠 "우리도 정말 몰라"로 버전이 바뀌었다. 이제는 '서강금융인회(서금회)' 등 친목단체들이 득세하는가 하면 끝단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관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비춰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인사철이 돌아오면 금융회사를 가장 잘 알고 감독해왔던 금융당국 대신 정치권 혹은 그보다 센 어디론가 달려가 동아줄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얘기들이 나온다. 관치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