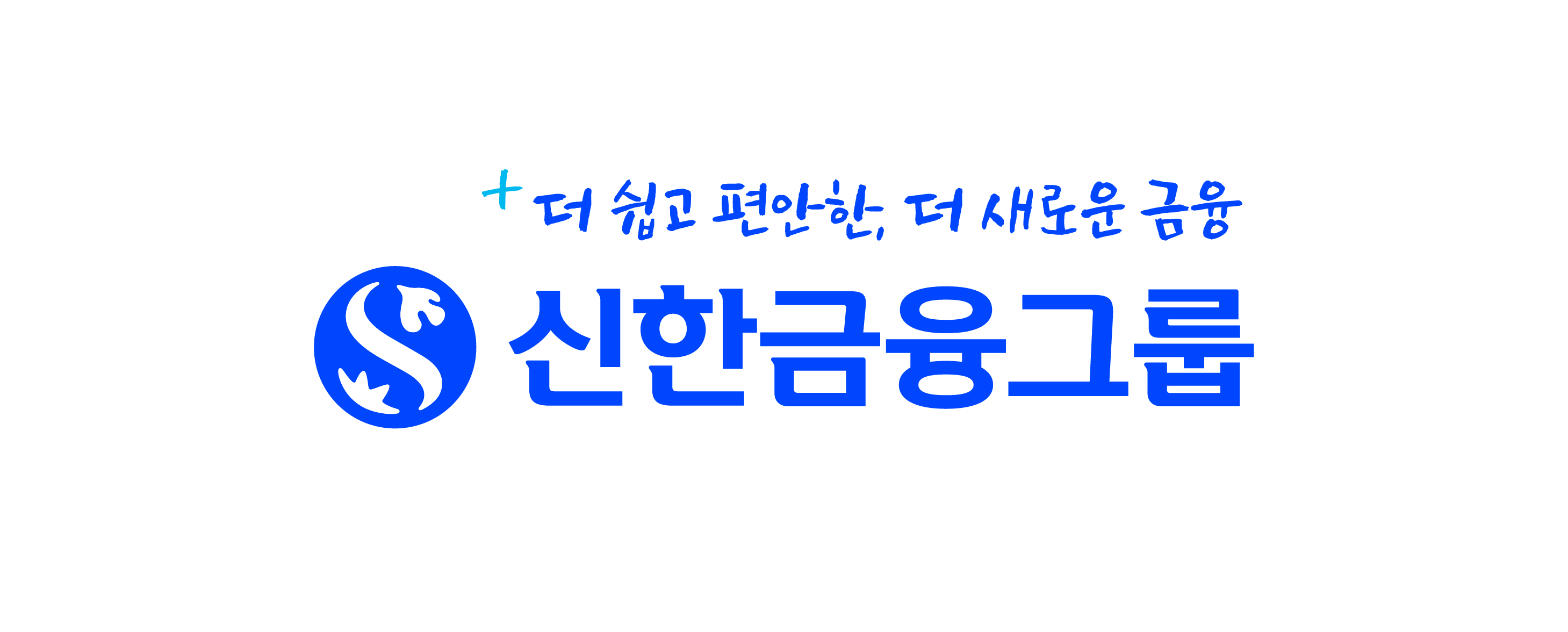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지분 30% 매각에 성공했다.
우리은행은 4전5기 도전 끝에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뀄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를 최대주주로 둔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된 지 1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낙하산 인사와 예산 통제 등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가 여전히 단일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완전한 민영화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 4전5기 끝에 과점주주 매각 성공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전 국내 대표 은행이던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두 은행은 외환위기를 넘지 못하고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있던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되면서 정부 소유 은행이 됐다.
그동안 우리은행의 민영화 과정은 말 그대로 질곡의 연속이었다. 2010년 이후 네 차례나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정부는 2010년 처음으로 경영권 매각 공고를 냈지만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실패했다. 2011년 두 번째 매각 작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개입 논란으로 물 건너갔다. 결국 MBK파트너스만 예비입찰에 참여하면서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였던 2012년 매각 역시 흐지부지 끝났다. KB금융지주와 교보생명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대형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입찰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통째 매각 방침을 틀었다. 2013년엔 지방은행과 증권사 등 계열사를 분리 매각했다.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에 매각했다. 우리투자증권과 우리바비바생명은 NH농협금융,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지주, 우리F&I는 대신증권에 넘겼다.
네 번째 시도였던 2014년엔 경영권 매각과 동시에 소수지분 매각을 병행했다.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에 소수지분 3.99%를 팔았지만, 경영권 매각엔 또 다시 실패했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경영권 매각을 아예 포기하고, 지분을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해 이번에 목표를 이뤘다. 다만 정부가 여전히 단일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완전한 민영화로 보긴 어렵다.

| ▲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 본점 광통관의 모습이다. 현재 우리은행 종로 지점으로 쓰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