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장 주식시장까지 고사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이들 비상장 시장에 대한 거래 문턱을 높이면서다.
이는 금융소비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이지만, 실익이 적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자칫 시장 위축과 음지화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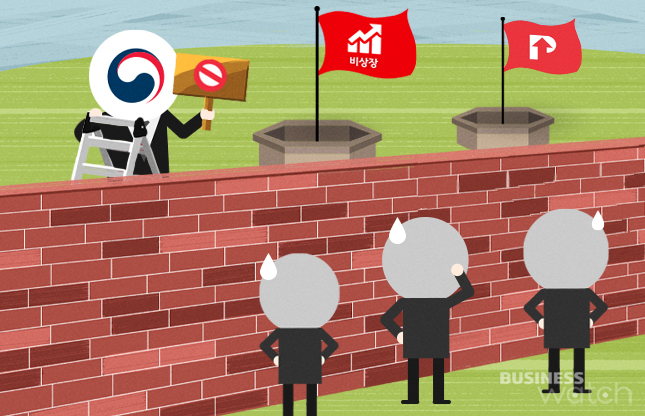
증권플러스·서울거래 비상장서 토스·컬리 모두 빠져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대폭 줄었다.
대표적인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현재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 종목은 각각 기존 457개에서 50개로, '서울거래 비상장'은 기존 174개에서 24개로 대폭 축소됐다. 90%에 육박하는 급감률이다.
비상장 주식은 그간 장외주식 시장(K-OTC)이나 장외거래 사설 사이트를 통한 1대 1 거래, 코넥스 거래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금융위원회가 앞선 두 플랫폼을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일반투자자도 이들 플랫폼에서 손쉽게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대급 유동성이 이들 비상장 주식시장에도 유입되면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비상장 거래가 급증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만해도 작년 11월말 기준 누적 거래대금이 65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가입 회원 수는 올해 5월말 기준 130만명이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두나무(업비트), 컬리(마켓컬리), 야놀자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비상장 기업에 미리 투자한 '선(先)학 개미'들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월 두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는 조건을 단 것이다.
작년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무상소각된 이스타항공 비상장 주식이 2주 넘게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된 게 화근이 됐다. 증권플러스가 뒤늦게 이스타항공의 거래를 정지하고 무상소각 이후 거래된 주식 대금을 환불 조치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결국 이달부터 일반투자자가 두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사업연도 매출이 5억원 이상이고 감사의견은 '적정' 등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한정됐다.
동시에 비상장 기업은 공시 담당자 1명을 필수로 지정하고, 플랫폼 역시 정기 공시서류 미제출 기업을 공표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조건이 붙게 됐다.
투자 회수 '중간' 단계 사라져…기회 봉쇄 지적
감독당국의 제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두 플랫폼 기준 거래종목이 평균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 유니콘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컬리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이밖에 오아시스와 쏘카, 바디프랜드 등도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일반투자자의 매수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경우 이전처럼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규시장 상장을 앞둔 유망기업들은 굳이 당국의 높아진 기준에 따르면서까지 비상장 시장에 남을 이유가 없다"며 "영세 기업의 경우 재무요건을 못 채웠거나 공시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시한 요건을 모두 맞추는 게 비상장사 입장에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비상장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상장 시장이 투자자가 적절한 때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종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 기업공개(IPO)에서 공모보다 회수가 중심이 되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상장 주식 거래가 다시 음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를 통해 음성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며 사기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게 불과 2년여 전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전문투자자 위주로만 시장을 꾸리겠다는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들은 IPO 이전 단계의 유망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봉쇄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