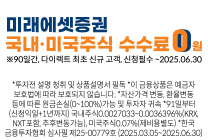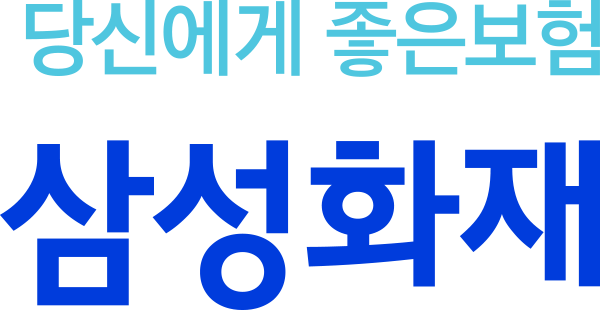한국거래소가 '공모펀드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업계에선 공모펀드 상장이 지연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를 목표로 공모펀드 직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거래소는 상장할 수 있는 펀드 전체 설정액 기준을 500억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중소형 운용사는 물론 대형 운용사도 5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공모펀드 직상장'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전달했다. 공모펀드 상장클래스(X Class) 최소 설정액은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70억원 이상, 펀드 전체 설정액을 500억원 이상으로 한다.▷관련기사: [단독]거래소, 공모펀드 직상장 허들 '500억'…"대형사만 수혜" 불만도(1월23일)
공모펀드를 직상장하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서 회장은 2023년 1월 취임 직후부터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강조하면서 직상장을 추진해 왔다. 서 회장은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 방문하면 1시간씩 시간이 걸리는 등 펀드 시장에 투자자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모펀드 시장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말→2025년 2분기, 또 지연 가능성
금투협은 지난 6월 2024년내 공모펀드 상장을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논의가 수차례 지연되면서 결국 11월이 돼서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뤄졌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34건(자산운용사 24곳·증권사 3곳·신탁업자 6곳·한국거래소)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로 지정하고 "연내(2024년) 거래소 규정을 마련, 2025년 1분기 거래소와 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2025년) 2분기 상장 공모펀드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모펀드 상장이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공모펀드 직상장 규정 마련이 목표 날짜(2024년 말)를 훌쩍 넘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2~3월 정도 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는 규정안이 확정돼야 상장할 상품을 준비할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상품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장이 하반기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게 업계 지배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규정 마련 이후에도 거래소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공모펀드 상장클래스의 수수료율 등을 결정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의 IT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시간도 필요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시스템을 개발, 테스트 과정에 있다"며 "공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확인한 후 공모펀드 시스템 개발에 들어서게 되면 절차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상품 준비가 완성되더라도 상장 심사 절차도 필요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 2분기 내 공모펀드 상장 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월에 규정안이 마련이 되는지 여부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며 "지연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절차와 별개로 운용사들은 유동성공급자(LP)도 관건이다. 현재 공모펀드 상장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운용사는 24개사이지만, 유동성 공급을 맡는 증권사는 3곳(미래에셋·SK·한국투자)에 불과하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상황에서 LP 사도 대형사 위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중·소형운용사는 상품을 마련한다고 해도 LP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모펀드 직상장은 서유석 회장의 공약인 만큼 LP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운용사를 지원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500억 이상 규모 펀드 많지 않아"
전체 펀드 설정액 규모(500억원)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거래소는 앞서 공모펀드 전체 설정액이 1000억원 이상인 펀드만 상장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00억원 넘는 펀드가 많지 않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 전체 설정액 규모를 절반(500억원)으로 줄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운용사의 부담을 고려해 전체 펀드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신탁원본액 500억원 이상의 펀드로 '공모펀드 직상장' 기준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500억원대 이상의 공모펀드 수가 적다는 것이다. 한 중소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 직상장은 ETF를 상장하지 못하는 중소형운용사의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데, 막상 500억원대의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곳은 대형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모펀드 직상장을 공약해온 서유석 금투협회장도 "공모펀드 직상장을 통해 중소형 운용사가 특화한 분야의 펀드를 대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500억원 허들이 관건이다.
대형운용사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ETF 시장이 성장한 이면에 공모펀드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운용사 관계자는 "대형사 입장에서도 총 설정액 500억원 이상의 펀드는 많지 않다"면서 "대형운용사는 공모펀드 대신 ETF를 활용해 빠르고 다양하게 상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펀드의 활용성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설정액 500억원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거래소는 공모펀드 직상장 가이드라인 규정을 제시하며 "업계 등 최종 의견수렴과 금융당국의 협의를 거쳐 최종 제도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한번 마련된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각 운용사 별로 어떤 상품을 상장할지에 대한 고민도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지정돼 있다.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각 운용사는 2년 내에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별로 대표 상품을 상장해서 투자자의 이목을 끄는 방안과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펀드를 상장해 공모펀드 시장 추이를 지켜보려는 방안 중에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