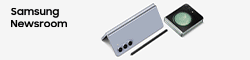작년 증권가 리서치센터에는 칼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은 보조 연구원을 포함해 10명의 연구원을 충원했다. 대형 증권사 가운데 리서치 인력을 늘린 곳은 하나대투증권이 유일했다. 하나대투증권은 리서치 범위를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자산시장 분석으로 확대했다.
최근 리서치 센터를 축소 개편한 현대증권도 유독 국제업무팀만큼은 국제기획부로 확대했다. 대신증권도 지난해 글로벌마켓 전략실을 신설했다. 글로벌 경제 분석과 해외자산 배분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독립리서치 기관인 영국 롬바드스트리트리서치, 캐나다 BCA리서치와 각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이머징시장 등과 관련한 투자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기관투자가들에게 한정하고 있다. 이슈가 있을 때는 PB 고객들에게만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부터 글로벌 투자은행인 제프리스의 리서치 자료를 기관 투자가들에게만 제공 중이다. 삼성증권과 취지는 비슷하다. 국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글로벌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 대신증권은 리서치센터와 경제연구소의 리서치 능력을 활용해 이들이 엄선한 종목에 투자하는 랩 상품을 선보였다. 지난해말 하나대투증권도 이와 비슷하게 자체 리서치 역량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랩 상품을 만들었고 최근까지 1600억원 가량의 수탁고를 올렸다. 수익률도 20%선을 넘어서며 꽤 괜찮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 대형사 리서치 해외로 눈돌려
한눈에 들어오는 이들의 공통점은 대형사에 속한다는 것. 대형 증권사들이 자산관리로 분야를 확대하면서 해외시장 정부와 포트폴리오가 필수가 됐다. 국내 상품만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자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해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시선은 해외로 향해 있다.
한국 증시가 미국 등 선진국 증시에 휘둘리면서 글로벌 리서치는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치밀하고 체계화됐다. 해외 리서치를 통해 해외 투자유망처를 발굴하고 상품 개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형사들의 경우 은행 PB나 기관투자가들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존 리서치 컨셉트는 이들의 욕구와 괴리가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리서치에 대한 니즈가 다르다"며 "금융지주사 아래에서 은행과 연계된 증권사들의 경우 이미 리서치가 소액 개인투자자를 겨냥했다기보다 연금 등 기관이나 PB 등 고액자산사를 대상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과 연계된 PB들이 있고 그들과 고객들 모두 새로운 정보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소형사 "강을 건널 배가 없다"
해외와 연계된 자산관리 움직임은 증권사 간 양극화를 뚜렷하게 만들고 있다. 중소형사들의 경우 이를 따라갈 인프라나 고객기반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해외에서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데이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중소형사로서는 이를 따라잡을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거래 확대를 추진했지만 한 국가의 시장지표를 추가할 때마다 데이터 비용 지급에만 연간 수억원이 들다보니 결국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형사들로서는 해외지수 서비스나 해외 쪽을 활용한 자산배분 확대가 초기비용 면에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소형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도 "해외투자나 자산관리로의 업무 확대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다"며 "니즈가 없는 곳도 있겠지만 있는 곳이라도 섣불리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중소형사의 도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순수하게 주식거래를 선호하는 개인 고객을 위주로 하는 중소형사라면 종목이나 시장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