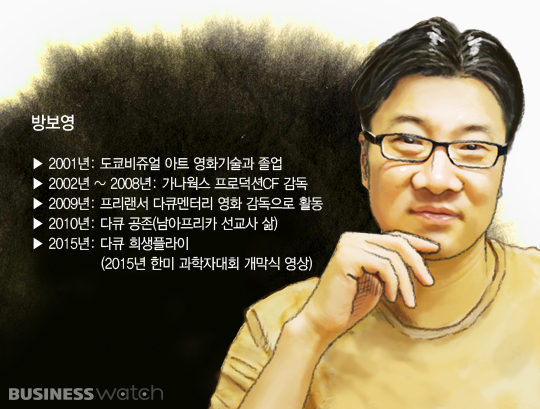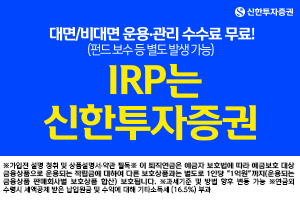어린시절 설날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빨간 고무대야를
머리에 이신 엄마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방앗간을 쫓아가는 아이
춥고 이른 새벽인데도
또 다른 고무대야들이
길게 한 줄로 늘어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기분 좋은 설렘이다.
우리 집 차례가 되고
뜨끈뜨끈한 가래떡이
길게 뽑아져 나오면
엄마가 한쪽 뚝 떼어
입에 넣어 주신다.
오물오물 먹던 그 맛
바로 설날의 맛이다.

서울 종로 이화동에서
50년째 방앗간을 지키는
이화떡집 김동호 사장님도
이른 새벽부터 예약된
가래떡을 뽑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족 간 모임이 줄면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
매년 감소세이긴 한데
올해는 훨씬 더 심하네."

아들 김충환 씨도
아버지를 돕고 있다.
"풀타임은 아니지만
25년째 일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요.
새벽부터 일하는 게
많이 힘들지 않냐고.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그 어디에 있겠어요.
아버지가 더 고생하시고
가게도 장만하신 덕분에
저는 편하게 일하고 있죠.
아버지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기까지 이뤄 놓으셨어요."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지만
제 아버지는 더 존경스러워요.
군대시절 얘긴데요.
훈련소에선 덤덤히 잘 지냈죠.
그런데 자대 배치 후
처음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다른 가족과 통화를 할 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전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위인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그때부터는 아버지 이름을
적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아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고
어느 순간 넓디넓던 등이
너무 작아진 걸 보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비로소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미 가신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길을 닦아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하죠."

떡을 뽑는 사이에도
방앗간은 손님들로 북적인다.
길을 지나던 단골손님들이
새해 인사차 일부러
가게를 들르기도 한다.
"'설이라 잠시 들렀어요.
전화도 연하장도 좋지만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게 좋잖아요.'
'설 끝나면 한잔하자고요.
전화만 하면 총알같이
내가 달려올 테니까.'"

김 사장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털어놓는다.
"내가 올해 76살인데
이곳에서 장사한지도
벌써 50년이 되었어.
15살 때인가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밥만 먹여주면 그냥 일했지.
방앗간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
잠잘 공간도 변변치 않아
밖에서 쪼그려 자기도 했지.
아내를 만난 게 축복이었지.
둘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
열심히 일해 아이들 키우고
가게도 집도 마련했으니까.
이게 행복이지.
이 떡집이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준 거지."

"가게를 시작할 당시만해도
이곳은 완전히 시골이었어.
지금이야 방앗간 앞까지
도로가 깨끗하게 포장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울창한 숲이었어.
낙산에서 두 줄기로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이 앞을 지났어.
지금은 서울대로 바뀌었지만
떡집 맞은편 주민센터가
경성대학 법대 건물이었지."

“당시엔 설 즈음이면
며칠씩 밤을 새우면서
계속 떡을 만들었어.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고무대야를 머리에 이고 와
쭉 줄을 서서 기다렸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누가 쌀을 이고 다녀
전화로 주문만 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
명절인데 한복도 안 입잖아."

"떡 맛은 정성이야.
거기에 오랜 전통이 더해진 게
이화떡집 방앗간만의 자랑이지.
세월이 흐르며 함께 늙어가니
이젠 많이 힘들긴 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지.
그래도 단골손님들이
우리 떡집을 사랑해 주니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거지."

"예전엔 명절이면 너무 바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
요즘엔 흔한 게 떡이지만
당시엔 나눠먹기도 힘들었어.
참 어렵게 살았지.
설이면 눈도 많이 왔어.
쌓인 눈을 헤치면서
쌀을 이고 방앗간에 와서
추운 줄도 모르고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가래떡을 뽑아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동네 사람들이어서
기다리면서도 즐거웠어.
명절 분위기가 그런 거지.
기다림과 즐거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웃지 못할 슬픈 플래카드가
시골 동네에 걸려 있다.
"불효자는 '옵'니다.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비록 마음만이라도
따뜻함으로 기다리고
또 즐겁게 만나는
모두의 설이 되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