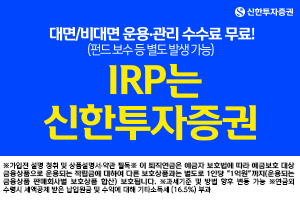"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월 발표된 'DOC와 춤을'이라는 노래의 한 소절이다. 당시만 해도 청바지 출근은 '상상'으로만 가능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많은 기업이 복장은 물론 회의와 업무방식, 야근, 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 직장 문화 또한 여전하다. 이제 막 직장 생활에 적응한 '김 대리들`의 고민을 들어본다. [편집자]

"회의라는 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놔도 결국 상사가 생각한 대로 밀어붙입니다. 말 그대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의 신조어)에요."
국내 대기업계열 금융사 입사 5년 차에 접어드는 이재영(가명·31세) 씨는 최근 영업부서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옮겨 연봉이 1000만원 이상 줄었지만 오히려 업무 만족도는 커졌다.
이전 부서보다 회의가 많아지긴 했지만 스트레스는 줄었다. 회의시간에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고 업무상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하는 문화 덕분이다. 이전 부서에선 부서장이 일방적인 업무지시만 하거나 실적이 나쁜 직원을 혼내는 게 전부였다.
대한민국 직장인에게 회의는 '피하고 싶은 시간'이다. 매일·매주·매월 단위로 회의를 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할 때도 많고, 여러명 불러놓고 몇 시간동안 의논했는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 밀고가는 상사도 꽤 있다. 효율적으로 바꿔보고 싶지만 선뜻 나서기도 어렵다.
효율적이어야 할 회의가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점점 쌓이다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병폐가 되기도 한다. 회의가 제 구실을 해야하는 이유다.
◇ 회의, 무엇이 중헌디?

| ▲ 여의도 증권가 모습./이명근 기자 qwe123@ |
상명하복식 군대 문화에 질려 회사를 옮기는 이들 대다수는 이직의 첫번째 이유로 비효율적인 회의를 꼽는다.
김신정(가명) 씨도 그랬다. 김 씨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다 지난해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 그는 "전 직장에서는 이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석 줄 짜리 내용도 보고서 형식에 맞춰야 했다"며 "새로 옮긴 곳에서는 간단한 보고는 이메일로 대체하고 업무에 연관되는 실무진들만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러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발표한 보고서에선 '비효율적인 회의'를 잦은 야근·문서중심 보고·여성에 대한 편견 등과 함께 국내 기업의 4가지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다 불러'서 '리더만 발언'하다가 '결론 없이 끝나는' 게 대한민국 기업에서 이뤄지는 회의의 모습이다.
직장인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중 현재 회의 문화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0%에 달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날 때가 많아서(40.0%) ▲회의의 진행과 구성이 비효율적이어서(37.6%) ▲상급자 위주의 수직적인 회의가 많아서(37.1%) 순으로 집계됐다.
회의를 주재하는 리더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회의는 직원들의 입을 닫게 만든다.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이현주(가명) 씨도 한국기업 인턴 시절을 떠올리면 답답해 진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해봤자 결국 위에서 이미 정한 대로 결론이 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나중에는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이곳에선 회의시간에 자기 의견을 거리낌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 업무에 반영돼 능동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회의는 목적이 아닌 도구
전문가들은 회의를 목적이 아닌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중개 앱을 운영하는 한 업체의 회의 문화는 참고할만하다. 이 업체는 현재 직원 수가 100명이 넘어 중소기업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는데도 스타트업 초기 시절 회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 ▲ 한 스타트업 직원들의 회의 모습. |
이 회사에선 대부분의 현안을 이메일로 해결한다.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원들이 모여 10~15분가량 압축적으로 얘기를 나눈다.
작년 말 대기업 계열 IT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성윤수(가명)씨는 격주 금요일 아침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는 "격주 금요일에 열리는 전 직원회의 시간은 상사에게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사회자에게 문자로 질문을 보내면 이를 모아서 상사에게 전달하고, 해당 상사가 답변해 주는 방식인데 짧은 회의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회사 대표가 직접 수평적 회의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도 있다. '배달의 민족' 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회의실을 학교 스탠드 형으로 만들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친구들과 학교 스탠드에 모여서 여러가지 주제로 놓고 자유롭게 토론했던 기억이 떠올라서다. 이 곳에서 직원들은 편안한 자세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를 나눈다.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다"며 "결국 그 방법들을 실제 회의 때 적용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의사결정 방식 등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회의하는 법
①픽사는 '플러싱(Plussing)'이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되 다른 사람의 의견에 피드백을 줄 때는 개선방안을 함께 더하는 방식(plus)이다.
②구글은 ‘이 회의는 정말 유용한가?’ ‘너무 자주 모이는 것 아닌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아닌 경우에는 과감히 회의를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③아마존은 싫더라도 그냥 인정하거나 제뜻을 굽히는 사람을 배제한다. CEO 제프 베조스는 데이터나 사실이 뒷받침된다면 끝까지 싸우기를 원한다.
④애플은 미팅 멤버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스티브 잡스는 빠르고 단순한 결정을 위해 너무 많은 생각이 어지럽게 모여있는 것을 질색해 항상 미팅 멤버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