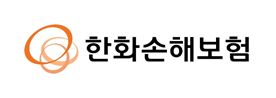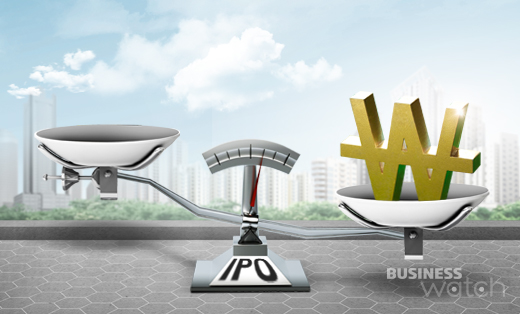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기업 상장 열풍이 뜨겁다. 올 들어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모두 56개(스팩 포함). 이중 19개 기업이 바이오 관련 업종에 직간접적으로 속한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 3곳 중 한 곳이 바이오 기업인 셈이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수와 견주면 숫자는 더 두드러진다. 작년 한 해 코스닥 상장 기업(스팩 포함)은 총 78개였는데, 이중 바이오 관련 기업은 단 6곳에 불과했다.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는 사업에 주력하는 기업도 포함한 숫자다.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바이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만에 7.7%에서 33.9%로 확대된 것.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 업종을 키우겠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쏟아낸 것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정부는 2005년 기술평가상장을 발표한 이래 코스닥 상장 경로를 넓히는 데 주력해왔다. 기술평가상장은 기업이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장래성을 보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문을 더 활짝 열어제꼈다. 2016년 말 이른바 테슬라 요건 상장 제도로 불리는 일반상장 이익미실현 특례제도와 성장성 특례상장을 도입한 것. 이 두 제도는 증권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추천하되 일정 기간 개인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면 이를 사들임으로써 책임을 지도록 구성돼 있다.
자금 수혈에 목말라하는 벤처 기업에 돈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선 일견 바람직해 보인다. 은행 대출과 정책 금융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
하지만 말을 바꿔보자. 특혜를 통해 상장했다는 말은, 곧 일반 상장 경로를 통해서는 상장할 수 없는 기업들이 상장했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 9곳 모두 현재 적자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흑자전환 성공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일반상장 이익미실현 특례제도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에 포함돼 있는 증권사의 풋백옵션 의무도 사실상 제도 실시에 따라오는 부담을 기업에서 증권사로 마치 폭탄 옮기듯 이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물론 기업이 잘 성장해서 투자금액을 불려서 회수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바이오 기업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상장 과정에 정부가 관여한 만큼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어느정도 부담을 나누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문을 열어제끼는 데만 열중하고 새는 물을 막는 데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운영하는 한국거래소 측과 금융당국 측은 모두 "기술특례 상장기업을 감독할 만한 별도의 계획이나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상대에 따라선 입장도 엇갈렸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공시 강화라든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금융당국 측 관계자는 "법적인 감독 주체는 한국거래소"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관련 연구기관 연구위원은 "기업의 성장 경로를 보면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시각을 유추할 수 있다"면서 "일반 상장 요건을 비껴간 상장 시도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준비가 안된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신약개발에 주력하는 상장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 비주력 사업을 병행하는 부담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현 정책 힘실어주기에 바빠 보인다.
아무리 정책은 우선순위를 가르는 작업이라고 하지만 기업이 내놓는 청사진을 그대로 믿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책 효과만을 보지 말고 시장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